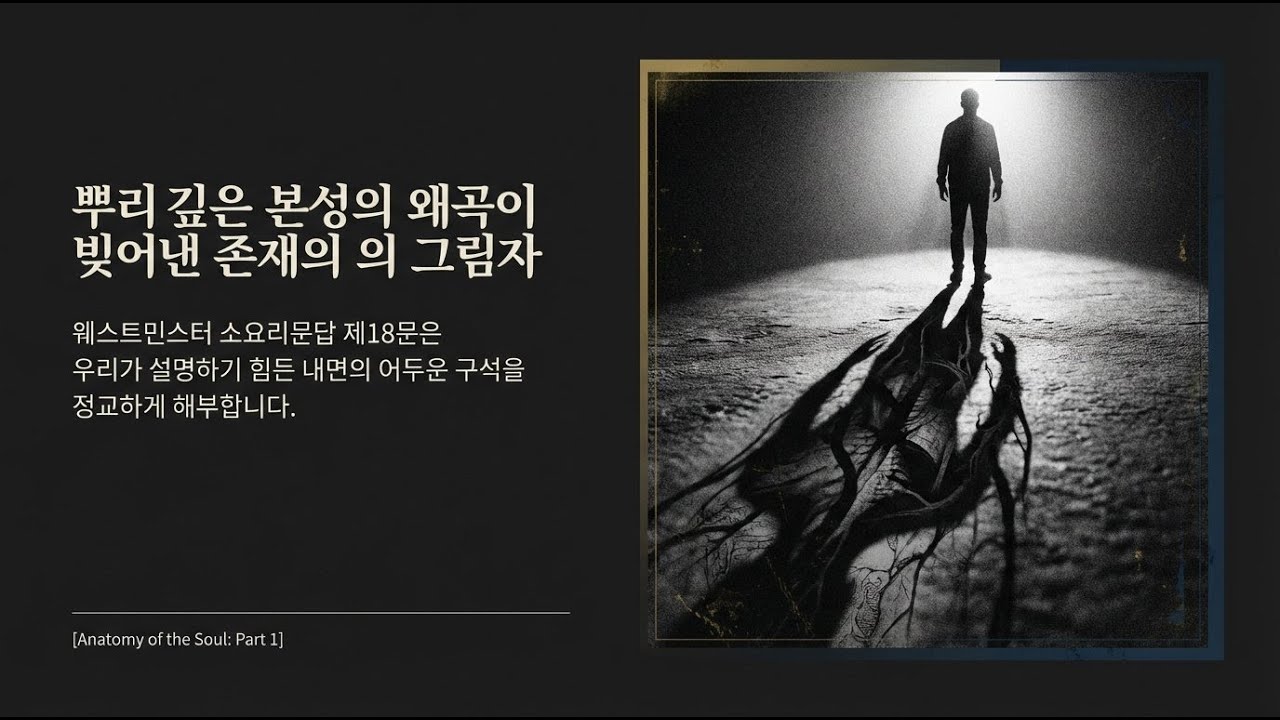эШДыМА ьВмэЪМыКФ тАШэШ╝ьЮР ьЮИыКФ ьЛЬъ░ДтАЩьЭД ъ░ЬьЭ╕ьЭШ ьЮРьЬаыбЬ ьЧмъ╕┤ыЛд. ъ╖╕ыЯмыВШ ъ│╝эХЩьЭА ыЛдые╕ ьЭ┤ьХ╝ъ╕░ые╝ эХЬыЛд. ь╡Ьъ╖╝ ы░ЬэСЬыРЬ ьЧмыЯм ьЛаъ▓╜ъ│╝эХЩ ьЧ░ъ╡мьЧР ыФ░ые┤ый┤, ьЩ╕ыбЬьЫАьЭА ыЛиьИЬэХЬ ъ░РьаХьЭ┤ ьХДыЛИыЭ╝ ьЛаъ▓╜ъ│ДьЧР ьЛдьаЬ ьЖРьГБьЭД ьЬаы░ЬэХШыКФ ьГЭым╝эХЩьаБ ьКдэК╕ыаИьКд ьЪФьЭ╕ьЭ┤ыЛд.
ьШБъ╡н ь╝АьЮДы╕МыжмьзА ыМАэХЩ ьЧ░ъ╡мьзДьЭА ьЩ╕ыбЬьЫАьЭД ыКРыБ╝ыКФ ьВмыЮМыУдьЭШ ыЗМые╝ MRIыбЬ ь┤мьШБэХЬ ъ▓░ъ│╝, **ъ╕░ьЦ╡ъ│╝ ъ░РьаХ ьб░ьаИьЭД ыЛ┤ыЛ╣эХШыКФ эХ┤ызИ(hippocampus)**ьЩА **ьаДьаДыСРьЧ╜(prefrontal cortex)**ьЭШ эЪМьГЙьзИ ы░АыПДъ░А ъ░РьЖМэХЬ ьВмьЛдьЭД ы│┤ъ│аэЦИыЛд. ьЭ┤ ы╢АьЬДыУдьЭА ьЭ╕ъ░ДьЭШ эМРыЛиыае, ъ│╡ъ░РыКеыае, ьЦ╕ьЦ┤ ь▓ШыжмьЩА ы░АьаСэХШъ▓М ъ┤АыаиыП╝ ьЮИыЛд.
ьВмэЪМьаБ ьГБэШ╕ьЮСьЪйьЭ┤ ы╢Аьб▒эХаьИШыбЭ ьЛаъ▓╜ьД╕эПмьЭШ ьЧ░ъ▓░ызЭьЭ┤ ьХ╜эЩФыРШъ│а, ьЮеъ╕░ьаБьЬ╝ыбЬ ьЛаъ▓╜ьаДыЛмым╝ьзИьЭШ ы╢Иъ╖аэШХьЭ┤ ы░ЬьГЭэХ┤ ыЗМьЭШ эЪМы│╡ыае ыШРэХЬ ыЦиьЦ┤ьзДыЛд.

ыЗМъ│╝эХЩьЭ┤ ы░ЭэЮМ ьЩ╕ыбЬьЫАьЭШ ьГЭым╝эХЩьаБ ыйФь╗дыЛИьжШ
ьЩ╕ыбЬьЫАьЭА ыЗМъ░А тАШьЬДэЧШтАЩьЭД ъ░РьзАэЦИьЭД ыХМ ыВШэГАыВШыКФ ьзДэЩФьаБ ъ▓╜ы│┤ ьЛаэШ╕ьЩА ьЬаьВмэХЬ эШХэГЬыбЬ ьЮСыПЩэХЬыЛд. ьЭ╕ъ░ДьЭА ьВмэЪМьаБ ьб┤ьЮмьЭ┤ъ╕░ьЧР ъ│аыж╜ьЭА ьГЭьб┤ьЧР ыМАэХЬ ы╢ИьХИьЭД ьЭ╝ьЬ╝эВдъ│а, ьЭ┤ыКФ ьКдэК╕ыаИьКд эШ╕ые┤ыкмьЭ╕ **ь╜Фые┤эЛ░ьЖФ(cortisol)**ьЭШ ы╢Ды╣Дые╝ ь┤ЙьзДэХЬыЛд.
ь╜Фые┤эЛ░ьЖФьЭШ ызМьД▒ьаБ ьГБьК╣ьЭА эХ┤ызИьЭШ ьЬДь╢Х, ьЛаъ▓╜ьД╕эПм ьЮмьГЭ ыКеыае ьаАэХШ, ьИШый┤ьЮеьХа, ъ╕░ьЦ╡ыае ъ░РэЗ┤ ыУ▒ьЬ╝ыбЬ ьЭ┤ьЦ┤ьзДыЛд. эК╣эЮИ ыЕ╕ыЕДь╕╡ьЭШ ъ▓╜ьЪ░, ьЭ┤ыЯ░ эШ╕ые┤ыкм ы│АэЩФъ░А ыЗМьЭШ ый┤ьЧнь▓┤ъ│ДьЭ╕ **ып╕ьД╕ьХДъ╡РьД╕эПм(microglia)**ьЭШ ъ│╝эЩЬьД▒эЩФые╝ ьЬаыПДэХ┤ ьЧ╝ьжЭ ы░ШьЭСьЭД ьХЕэЩФьЛЬэВиыЛд.
ьжЙ, ьЩ╕ыбЬьЫАьЭА ыЛиьИЬэХЬ ьЛмыжм ым╕ьаЬъ░А ьХДыЛИыЭ╝ **ьЛаъ▓╜ьЧ╝ьжЭ(neuroinflammation)**ьЭД ьЬаы░ЬэХШыКФ ьЛаь▓┤ьаБ ьзИэЩШьЭШ эХЬ эШХэГЬыЛд.
эШ╝ьЮР ьЮИыКФ ьЛЬъ░ДьЭ┤ ыКШьИШыбЭ ьдДьЦ┤ыУЬыКФ ьЭ╕ьзАъ╕░ыКе
ъ╡ньаЬ ь╣ШыздьЧ░ъ╡мьД╝эД░(ADI)ыКФ 2025ыЕДъ╣МьзА ьаД ьД╕ъ│Д ь╣Шызд эЩШьЮРъ░А 7ь▓Ь5ы░▒ызМ ыкЕьЧР ьЭ┤ые╝ ъ▓ГьЬ╝ыбЬ ьаДызЭэХШый░, ьВмэЪМьаБ ъ│аыж╜ьЭД ъ░АьЮе эБ░ ьЬДэЧШ ьЪФьЭ╕ ьдС эХШыВШыбЬ ьзАыкйэЦИыЛд.
ьЧ░ъ╡мьЧР ыФ░ые┤ый┤, эГАьЭ╕ъ│╝ьЭШ ыМАэЩФыВШ эЩЬыПЩьЭА ыЗМьЭШ ьЦ╕ьЦ┤ьдСь╢Фые╝ ьЮРъ╖╣эХШъ│а, ы│╡ьЮбэХЬ ьВмъ│а ъ│╝ьаХьЭД ь┤ЙьзДэХШьЧм ьЛаъ▓╜ызЭьЭД ъ░ХэЩФэХЬыЛд. ъ╖╕ыЯмыВШ эШ╝ьЮР ьЮИыКФ ьЛЬъ░ДьЭ┤ ыКШьЦ┤ыВШый┤ ьЭ┤ ъ░ЩьЭА ьЭ╕ьзА ьЮРъ╖╣ьЭ┤ ъ╕Йъ░РэХ┤ ъ╕░ьЦ╡ыаеъ│╝ эМРыЛиыае ьаАэХШ, ьЪ░ьЪ╕ ьжЭьГБ ьжЭъ░АыбЬ ьЭ┤ьЦ┤ьзДыЛд.
эК╣эЮИ ьЮеъ╕░ъ░Д ъ│аыж╜ыРЬ ьВмыЮМьЭА ьЦ╕ьЦ┤ ьВмьЪй ы╣ИыПДьЩА ьЦ┤эЬШыаеьЭ┤ ъ░РьЖМэХШый░, ьЭ┤ыКФ ыЗМьЭШ ьЦ╕ьЦ┤ ь▓Шыжм ыКеыае ьаАэХШыбЬ ьзБъ▓░ыРЬыЛд.
ъ┤Аъ│Дъ░А ыЗМые╝ ьаКъ▓М эХЬыЛд тАФ ьВмэЪМьаБ ьЧ░ъ▓░ьЭШ эЮШ
ып╕ъ╡н эХШы▓ДыУЬыМАэХЩъ╡РьЭШ тАШьД▒ьЭ╕ы░ЬыЛм ьЮеъ╕░ьЧ░ъ╡мтАЩыКФ **ъ░АьЮе ъ▒┤ъ░ХэХШъ│а эЦЙы│╡эХЬ ьВмыЮМыУдьЭШ ъ│╡эЖ╡ьаРьЭ┤ тАШъ╣КьЭА ьЭ╕ъ░Дъ┤Аъ│ДтАЩ**ыЭ╝ыКФ ьВмьЛдьЭД ы░ЭэШАыГИыЛд.
ьВмэЪМьаБ ьЧ░ъ▓░ьЭА ыЗМьЭШ ыПДэММып╝ ьЛЬьКдэЕЬьЭД ьЮРъ╖╣эХШьЧм ъ╕НьаХьаБьЭ╕ ъ░РьаХьЭД ьЬаыПДэХШъ│а, ыПЩьЛЬьЧР **ьЛЬыГЕьКд ъ░АьЖМьД▒(synaptic plasticity)**ьЭД эЦеьГБьЛЬь╝Ь эХЩьК╡ ыКеыаеъ│╝ ъ╕░ьЦ╡ыаеьЭД ьЬаьзАэХЬыЛд.
ыШРэХЬ ьГИыбЬьЪ┤ ъ┤Аъ│Дые╝ ыз║ъ▒░ыВШ эГАьЭ╕ъ│╝ ыМАэЩФэХа ыХМ ыЗМыКФ ьГИыбЬьЪ┤ ьЮРъ╖╣ьЭД ы░ЫьХД ьЛаъ▓╜ьД╕эПм ъ░ДьЭШ ьЧ░ъ▓░ьЭ┤ ъ░ХэЩФыРШый░, ьЭ┤ыКФ ъ│з тАШьЭ╕ьзАьаБ ьШИы╣Дыае(cognitive reserve)тАЩьЭД ыЖТьЭ┤ыКФ ъ▓░ьаХьаБ ьЪФьЭ╕ьЬ╝ыбЬ ьЮСьЪйэХЬыЛд.
ьжЙ, ьЭ╕ъ░Дъ┤Аъ│ДыКФ ыЗМые╝ ьЬДэХЬ тАШы╣ДэГАып╝тАЩьЭ┤ьЮР тАШьШИы░йьЭШэХЩтАЩьЭ╕ ьЕИьЭ┤ыЛд.
эШ╝ьЮР ьВмыКФ ьЛЬыМАыКФ эФ╝эХа ьИШ ьЧЖыКФ эШДьЛдьЭ┤ьзАызМ, ьЩ╕ыбЬьЫАьЭД ы░йь╣ШэХШыКФ ъ▓ГьЭА ыЗМьЭШ ыЕ╕эЩФые╝ ьХЮыЛ╣ъ╕░ыКФ ьДаэГЭьЭ┤ыЛд.
ыЗМые╝ ьаКъ▓М ьЬаьзАэХШъ╕░ ьЬДэХ┤ьДЬыКФ ыЛиьИЬэЮИ ьЪ┤ыПЩьЭ┤ыВШ ьЛЭьК╡ъ┤АьЭД ъ┤АыжмэХШыКФ ъ▓ГьЭД ыДШьЦ┤, ьВмэЪМьаБ ъ┤Аъ│Дые╝ ьаБъ╖╣ьаБьЬ╝ыбЬ ьЬаьзАэХШыКФ ыЕ╕ыаеьЭ┤ эХДьЪФэХШыЛд.
ъ░Аы▓╝ьЪ┤ ьЭ╕ьВм, ьззьЭА ыМАэЩФ, ыкиьЮД ь░╕ьЧм ыУ▒ ьЭ╝ьГБьЭШ ьЮСьЭА ъ╡РыеШъ░А ьЛаъ▓╜ьД╕эПмые╝ эЩЬьД▒эЩФьЛЬэВдъ│а, ьЩ╕ыбЬьЫАьЬ╝ыбЬ ьЭ╕эХЬ эЗ┤эЩФые╝ ыКжь╢ШыЛд.
ъ▓░ъ╡н, ыЗМ ъ▒┤ъ░ХьЭШ ы╣Дъ▓░ьЭА эШ╝ьЮРъ░А ьХДыЛИыЭ╝ эХиъ╗ШьЭ╝ ыХМ ьЩДьД▒ыРЬыЛ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