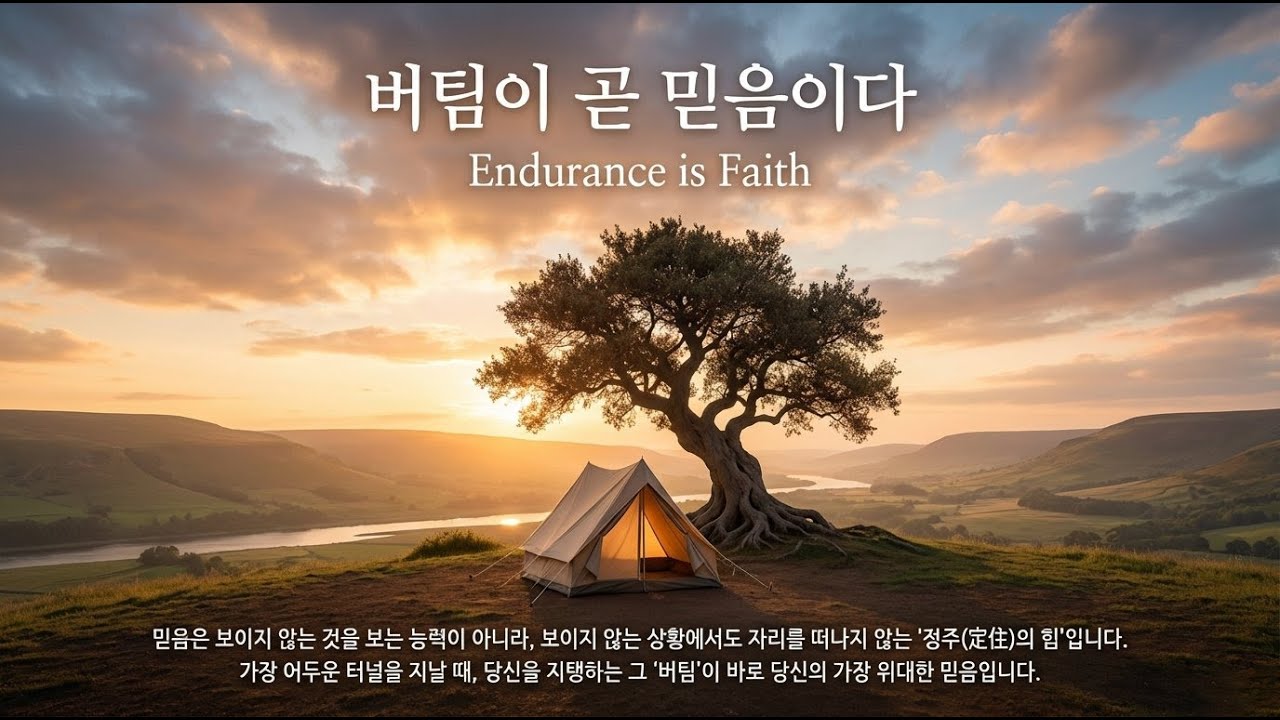м„ұкіөмқҙлқјлҠ” мқҙлҰ„мқҳ к°ҖмһҘ лӢ¬мҪӨн•ң лҸ…л°°
мҡ°лҰ¬лҠ” мў…мў… "мӢӨнҢЁлҠ” м„ұкіөмқҳ м–ҙлЁёлӢҲ"лқјкі л§җн•ңлӢӨ. н•ҳм§Җл§Ң м—ӯмӮ¬мқҳ кұ°мҡёмқ„ лӢҰм•„ л“Өм—¬лӢӨліҙл©ҙ, к·ё л°ҳлҢҖмқҳ кІҪмҡ°к°Җ нӣЁм”¬ лҚ” 비극м Ғмқҙкі м№ҳлӘ…м ҒмқҙлқјлҠ” мӮ¬мӢӨмқ„ л°ңкІ¬н•ҳкІҢ лҗңлӢӨ. мҰү, "м„ұкіөмқҙм•јл§җлЎң мӢӨнҢЁмқҳ м•„лІ„м§Җ"лқјлҠ” м—ӯм„ӨмқҙлӢӨ. мҳҒкөӯмқҳ м—ӯмӮ¬н•ҷмһҗ м•„лҶҖл“ң нҶ мқёл№„лҠ” мқҙлҘј 'л¬ҙмғҒн•ң мһҗм•„мқҳ мҡ°мғҒнҷ”(Idolization of an Ephemeral Self)'лқјкі лӘ…лӘ…н–ҲлӢӨ. кіјкұ°мқҳ мҠ№лҰ¬м—җ м·Ён•ҙ, к·ё м„ұкіө л°©мӢқмқ„ мҳҒмӣҗл¶Ҳл©ёмқҳ 진лҰ¬мқё м–‘ л– л°ӣл“ӨлӢӨк°Җ кІ°көӯ ліҖнҷ”мқҳ нҢҢлҸ„м—җ нң©м“ёл Ө мӮ¬лқјм§ҖлҠ” нҳ„мғҒмқ„ мқјм»«лҠ” л§җмқҙлӢӨ.
600л…„мқҙ л„ҳлҠ” мӢңк°„ лҸҷм•Ҳ м„ё лҢҖлҘҷмқ„ нҳёл №н–ҲлҚҳ кұ°лҢҖ м ңкөӯ, мҳӨмҠӨл§Ң. к·ёл“Өмқҳ м—ӯмӮ¬лҠ” мқҙ нҶ мқёл№„мқҳ лӘ…м ңк°Җ м–јл§ҲлӮҳ 섬лң©н•ҳкІҢ л“Өм–ҙл§һлҠ”м§Җ ліҙм—¬мЈјлҠ” кұ°лҢҖн•ң мә”лІ„мҠӨлӢӨ. к·ёл“ӨмқҖ л„Ҳл¬ҙлӮҳ м°¬лһҖн–Ҳкё°м—җ, мҳӨнһҲл Ө к·ё м°¬лһҖн•Ём—җ лҲҲмқҙ л©Җм–ҙлІ„л ёлӢӨ. н•ңл•Ң м„ёкі„мқҳ мӨ‘мӢ¬мқҙм—ҲмңјлӮҳ м„ңм„ңнһҲ мЈјліҖл¶ҖлЎң л°Җл ӨлӮҳл©° кі нҶөмҠӨлҹҪкІҢ мҲЁмқ„ кұ°л‘” н•ң кұ°мқёмқҳ мқҙм•јкё°лҘј нҶөн•ҙ, мҡ°лҰ¬ мӮ¶м—җ л“ңлҰ¬мҡҙ 'м„ұкіөмқҳ к·ёлҰјмһҗ'лҘј мӮҙнҺҙліёлӢӨ.
л¶Җлҹ¬м§„ кІҖ: мҳҲлӢҲмІҙлҰ¬, мҲҳнҳёмһҗм—җм„ң кҙҙл¬јлЎң
мҳӨмҠӨл§Ң м ңкөӯмқҳ мҙҲкё°лҘј мғҒмғҒн•ҙ ліҙлқј. л¶үмқҖ к№ғл°ң м•„лһҳ, кё°лҸ…көҗ мҶҢл…„ 징집 м ңлҸ„мқё 'лҚ°лёҢмӢңлҘҙл©”'лҘј нҶөн•ҙ м„ л°ңлҗң мөңм •мҳҲ л¶ҖлҢҖ 'мҳҲлӢҲмІҙлҰ¬(Janissaries)'к°Җ м„ң мһҲлӢӨ. к·ёл“ӨмқҖ кІ°нҳјлҸ„, м§Ғм—…лҸ„ нҸ¬кё°н•ң мұ„ мҳӨм§Ғ мҲ нғ„мқ„ м•„лІ„м§ҖлЎң 섬기며 нҸүмғқмқ„ м „мһҘм—җм„ң ліҙлғҲлӢӨ. к·ёл“Өмқҳ мҶҘлӢЁм§Җ(Kazan)к°Җ кұёлҰ¬лҠ” кіімқҙ кі§ м ңкөӯмқҳ көӯкІҪмқҙм—Ҳкі , к·ёл“Өмқҳ н–ү진 мҶҢлҰ¬лҠ” мң лҹҪ м „мІҙлҘј кіөнҸ¬м—җ л–ЁкІҢ н–ҲлӢӨ. к·ёл“ӨмқҖ м ңкөӯ м„ұкіөмқҳ мӮҙм•„мһҲлҠ” мҰқкұ°мқҙмһҗ, л¬ҙм Ғмқҳ мғҒ징мқҙм—ҲлӢӨ.
н•ҳм§Җл§Ң, мқҙ 'м„ұкіөмқҳ кё°м–ө'мқҙ лҸ…мқҙ лҗҳм—ҲлӢӨ. мң лҹҪмқҳ кө°лҢҖк°Җ лЁёмҠӨнӮ· мҶҢмҙқкіј к°ҖліҚкі л№ лҘё м•јм „ нҸ¬лі‘мңјлЎң л¬ҙмһҘн•ҳл©° кө°мӮ¬ нҳҒлӘ…мқ„ мқјмңјнӮ¬ л•Ң, мҳҲлӢҲмІҙлҰ¬лҠ” м—¬м „нһҲ л¬ҙкұ°мҡҙ м „нҶө мқҳліөкіј кө¬мӢқ л‘”кё°лҘј кі м§‘н–ҲлӢӨ. к·ёл“Өм—җкІҢ ліҖнҷ”лһҖ кі§ мһҗмӢ л“Өмқҳ кё°л“қк¶Ңмқ„ мһғлҠ” кІғмқҙм—ҲлӢӨ. м „мһҘм—җм„ңмқҳ нҢЁл°°к°Җ кұ°л“ӯлҗҳм–ҙлҸ„ к·ёл“ӨмқҖ "мҡ°лҰ¬лҠ” мҳҲлӢҲмІҙлҰ¬лӢӨ. мҡ°лҰ¬мқҳ л°©мӢқмқҙ кі§ мҠ№лҰ¬мқҳ л°©мӢқмқҙлӢӨ"лқјлҠ” мҳӨл§Ңм—җ л№ м ё мһҲм—ҲлӢӨ.
кёүкё°м•ј к·ёл“ӨмқҖ м „мһҘмқҙ м•„лӢҢ к¶Ғм •м—җм„ң м№јмқ„ нңҳл‘җлҘҙкё° мӢңмһ‘н–ҲлӢӨ. мһҗмӢ л“Өмқҳ мһ…л§ӣм—җ л§һм§Җ м•ҠлҠ” мҲ нғ„мқ„ нҸҗмң„н•ҳкі мӮҙн•ҙн•ҳл©°, к°ңнҳҒмқ„ к°ҖлЎңл§үлҠ” к°ҖмһҘ кұ°лҢҖн•ң кұёлҰјлҸҢмқҙ лҗҳм—ҲлӢӨ. 1826л…„, л§Ҳнқҗл¬ҙл“ң 2м„ё мҲ нғ„мқҖ н”јлҲҲл¬јмқ„ лЁёкёҲкі кІ°лӢЁмқ„ лӮҙлҰ°лӢӨ. мһҗкё°мқҳ мҶҗмңјлЎң л§Ңл“ мһҗмӢқкіјлҸ„ к°ҷмқҖ кө°лҢҖлҘј н–Ҙн•ҙ мӢ мӢқ лҢҖнҸ¬лҘј л°ңмӮ¬н•ң кІғмқҙлӢӨ. 'мҳҲлӢҲмІҙлҰ¬мқҳ лҢҖн•ҷмӮҙ'мқҙлқј л¶ҲлҰ¬лҠ” мқҙ 비극м Ғмқё мӮ¬кұҙмқҖ, кіјкұ°мқҳ мҳҒкҙ‘м—җ 집착н•ҳлҠ” мЎ°м§Ғмқҙ м–ҙл–»кІҢ к·ё мЎ°м§Ғмқ„ лӮімқҖ лӘЁмІҙк№Ңм§Җ нҢҢкҙҙн• мҲҳ мһҲлҠ”м§ҖлҘј ліҙм—¬мЈјлҠ” мІҳм Ҳн•ң л“ңлқјл§ҲмҳҖлӢӨ. мҠӨмҠӨлЎң 진нҷ”н•ҳм§Җ лӘ»н•ң м№јмқҖ кІ°көӯ мЈјмқёмқҳ мҶҗм—җ мқҳн•ҙ л¶Җлҹ¬м ём•јл§Ң н–ҲлӢӨ.
н…… л№Ҳ мӢңмһҘ: мӢӨнҒ¬лЎңл“ңмқҳ м№Ёл¬өкіј л°”лӢӨмқҳ мҶҢмқҢ
м ңкөӯмқҳ мӢ¬мһҘ мқҙмҠӨнғ„л¶Ҳ, к·ёкіімқҳ к·ёлһңл“ң л°”мһҗлҘҙлҠ” н•ңл•Ң м„ёкі„мқҳ лӘЁл“ л¶Җк°Җ лӘЁмқҙлҠ” м ҖмҲҳм§ҖмҳҖлӢӨ. лҸҷл°©мқҳ 비лӢЁкіј н–ҘмӢ лЈҢлҠ” л°ҳл“ңмӢң мҳӨмҠӨл§Ңмқҳ мҳҒнҶ лҘј кұ°міҗм•јл§Ң мң лҹҪмңјлЎң к°Ҳ мҲҳ мһҲм—Ҳкі , м ңкөӯмқҖ к·ё кёёлӘ©м—җ м•үм•„ л§үлҢҖн•ң кҙҖм„ёлҘј кұ°л‘¬л“ӨмҳҖлӢӨ. мқҙкІғмқҖ л„Ҳл¬ҙлӮҳ мүҪкі нҷ•мӢӨн•ң м„ұкіө лӘЁлҚёмқҙм—ҲлӢӨ. л•…л§Ң м§ҖнӮӨкі мһҲмңјл©ҙ нҷ©кёҲмқҙ көҙлҹ¬л“Өм–ҙ мҷ”мңјлӢҲк№Ң.
к·ёлҹ¬лӮҳ 15м„ёкё° нӣ„л°ҳ, м Җ л©ҖлҰ¬ мқҙлІ лҰ¬м•„л°ҳлҸ„м—җм„ң мӢңмһ‘лҗң мһ‘мқҖ ліҖнҷ”к°Җ лӮҳ비нҡЁкіјлҘј мқјмңјмј°лӢӨ. л°”мҠӨмҪ” лӢӨ к°Җл§ҲмҷҖ мҪңлҹјлІ„мҠӨ к°ҷмқҖ лӘЁн—ҳк°Җл“Өмқҙ мҳӨмҠӨл§Ңмқ„ кұ°м№ҳм§Җ м•ҠлҠ” мғҲлЎңмҡҙ л°”лӢ·кёёмқ„ м—ҙм–ҙлІ„лҰ° кІғмқҙлӢӨ. м§ҖмӨ‘н•ҙлҠ” м җм°Ё нҳёмҲҳлЎң м „лқҪн–Ҳкі , лҢҖм„ңм–‘мқҳ кұ°м№ң нҢҢлҸ„ мң„лЎң л¶Җмқҳ мӨ‘мӢ¬м¶•мқҙ мқҙлҸҷн–ҲлӢӨ.
м•ҲнғҖк№қкІҢлҸ„ мҳӨмҠӨл§Ңмқҳ м§Җл°°мёөмқҖ мқҙ кұ°лҢҖн•ң н•ҙмқјмқҳ м „мЎ°лҘј 'м°»мһ” мҶҚмқҳ нғңн’Қ'мңјлЎң м№ҳл¶Җн–ҲлӢӨ. "лҲ„к°Җ м Җ мң„н—ҳн•ң л§қл§қлҢҖн•ҙлЎң к°ҖкІ лҠ”к°Җ? лӘЁл“ кёёмқҖ м—¬м „нһҲ мҡ°лҰ¬ л•…мңјлЎң нҶөн•ңлӢӨ." к·ёл“ӨмқҖ кіјкұ°мқҳ м§ҖлҸ„л§Ңмқ„ л¶ҷл“Өкі мһҲм—ҲлӢӨ. көҗм—ӯмқҳ нҢЁлҹ¬лӢӨмһ„мқҙ 'мңЎмғҒ'м—җм„ң 'н•ҙм–‘'мңјлЎң л°”лҖҢкі , 'мӨ‘кі„ л¬ҙм—ӯ'м—җм„ң 'м§Ғм ‘ л¬ҙм—ӯ'мңјлЎң л°”лҖҢлҠ” лҸҷм•Ҳ, м ңкөӯмқҳ кіік°„мқҖ м„ңм„ңнһҲ л§җлқјк°”лӢӨ. кіјкұ°мқҳ м„ұкіө л°©м •мӢқмқҙм—ҲлҚҳ 'м§ҖлҰ¬м Ғ мқҙм җ'мқҖ, ліҖнҷ”м—җ лҲҲк°җмқҖ мһҗл“Өм—җкІҢ лҚ” мқҙмғҒ м•„л¬ҙлҹ° нҳңнғқлҸ„ мЈјм§Җ м•Ҡм•ҳлӢӨ.
көім–ҙлІ„лҰ° нҺң: л©Ҳм¶°лІ„лҰ° мӢңкі„мҷҖ кҙҖлЈҢм ң
мҳӨмҠӨл§Ңм ңкөӯмқҳ м „м„ұкё°лҘј мқҙлҒҲ мүҙл Ҳмқҙл§Ң лҢҖм ң мӢңм Ҳ, мҳӨмҠӨл§Ңмқҳ кҙҖлЈҢм ңлҠ” мӢңкі„ нҶұлӢҲл°”нҖҙмІҳлҹј м •көҗн–ҲлӢӨ. лҠҘл Ҙ мӨ‘мӢ¬мқҳ мқёмһ¬ л“ұмҡ©кіј мӨ‘м•ҷ집к¶Ңм Ғмқё нҶөм№ҳлҠ” кҙ‘нҷңн•ң мҳҒнҶ лҘј н•ҳлӮҳлЎң 묶лҠ” к°•л Ҙн•ң л°§мӨ„мқҙм—ҲлӢӨ. н•ҳм§Җл§Ң 'мҷ„лІҪн•ҳлӢӨ'лқјлҠ” м°¬мӮ¬лҠ” кі§ 'кі м№ н•„мҡ”к°Җ м—ҶлӢӨ'лқјлҠ” м°©к°Ғмқ„ л¶Ҳлҹ¬мҷ”лӢӨ.
м„ёмӣ”мқҙ нқҗлҘҙл©° к·ё м •көҗн–ҲлҚҳ мӢңмҠӨн…ңмқҖ л…№мҠ¬кі көім–ҙлІ„л ёлӢӨ. кҙҖм§ҒмқҖ л§ӨкҙҖл§Өм§Ғмқҳ лҢҖмғҒмқҙ лҗҳм—Ҳкі , лҮҢл¬јмқҖ н–үм •мқҳ мңӨнҷңмң к°Җ лҗҳм—ҲлӢӨ. м„ңкө¬ м—ҙк°•л“Өмқҙ к·јлҢҖм Ғмқё көӯлҜј көӯк°Җ мӢңмҠӨн…ңкіј нҡЁмңЁм Ғмқё н–үм • мІҙкі„лҘј кө¬м¶•н•ҳл©° м§ҲмЈјн• л•Ң, мҳӨмҠӨл§Ңмқҳ кҙҖлЈҢл“ӨмқҖ м—¬м „нһҲ мҲҳл°ұ л…„ м „мқҳ м„ңлҘҳ м–‘мӢқмқ„ кі м§‘н•ҳл©° ліҖнҷ”лҘј кұ°л¶Җн–ҲлӢӨ.
л’ӨлҠҰкІҢ 19м„ёкё°м—җ мқҙлҘҙлҹ¬, вҖҳнғ„м§Җл§ҲнҠё(Tanzimat, к°ңнҳҒ)вҖҷлқјлҠ” мқҙлҰ„мңјлЎң м„ңкө¬нҷ”лҘј мӢңлҸ„н–Ҳм§Җл§Ң, к·ёкІғмқҖ л„Ҳл¬ҙ лҠҰмқҖ мІҳл°©мқҙм—ҲлӢӨ. мқҙлҜё мҚ©м–ҙл“Өм–ҙк°Җ лјҲл§Ң лӮЁмқҖ лӘём—җ нҷ”л Өн•ң м„ңм–‘мӢқ мҳ·мқ„ мһ…нһҢлӢӨкі н•ҙм„ң мЈҪм–ҙк°ҖлҠ” мғқлӘ…мқҙ лҸҢм•„мҳ¬ лҰ¬ л§Ңл¬ҙн–ҲлӢӨ. н•ңл•Ң м ңкөӯмқ„ м§Җнғұн–ҲлҚҳ к°•л Ҙн•ң кҙҖлЈҢм ңлқјлҠ” м„ұкіө мҡ”мқёмқҙ, мң м—°м„ұмқ„ мһғм–ҙлІ„лҰ¬мһҗ, м ңкөӯмқҳ мҲЁнҶөмқ„ мЎ°мқҙлҠ” к°ҖмһҘ л¬ҙкұ°мҡҙ мЎұмҮ„к°Җ лҗҳм–ҙлІ„лҰ° кІғмқҙлӢӨ.

лӢ«нһҢ м°Ҫл¬ё: 300л…„мқҳ мӢңм°Ё, м§Җм„ұмқҳ лӘ°лқҪ
к°ҖмһҘ лјҲм•„н”Ҳ мӢӨмұ…мқҖ л°”лЎң 'м§Җм„ұмқҳ мҳӨл§Ң'мқҙм—ҲлӢӨ. 15м„ёкё°к№Ңм§Җл§Ң н•ҙлҸ„ мҳӨмҠӨл§ҢмқҖ мң лҹҪліҙлӢӨ мҡ°мӣ”н•ң л¬ёнҷ”лҘј к°ҖмЎҢлӢӨлҠ” мһҗл¶ҖмӢ¬мқҙ мһҲм—ҲлӢӨ. н•ҳм§Җл§Ң к·ё мһҗл¶ҖмӢ¬мқҖ кі§ 'л°°мҡё н•„мҡ”к°Җ м—ҶлӢӨ'лҠ” 아집мңјлЎң ліҖм§Ҳлҗҳм—ҲлӢӨ. к°ҖмһҘ мғҒ징м Ғмқё мӮ¬кұҙмқҖ л°”лЎң мқёмҮ„мҲ мқҳ лҸ„мһ… м§Җм—°мқҙлӢӨ.
кө¬н…җлІ лҘҙнҒ¬мқҳ мқёмҮ„кё°к°Җ мң лҹҪмқ„ м§ҖмӢқмқҳ нҳҒлӘ…мңјлЎң мқҙлҒҢ л•Ң, мҳӨмҠӨл§Ң м ңкөӯмқҖ "мӢ м„ұн•ң кІҪм „мқ„ кё°кі„ л”°мң„лЎң м°Қм–ҙлӮј мҲҳ м—ҶлӢӨ"лқјлҠ” мў…көҗм Ғ, л¬ёнҷ”м Ғ мқҙмң лЎң л¬ҙл Ө 300л…„ к°Җк№Ңмқҙ м•„лһҚм–ҙ мқёмҮ„лҘј кёҲм§Җн–ҲлӢӨ. мң лҹҪм—җм„ң мҲҳл§Ң к¶Ңмқҳ мұ…мқҙ мҸҹм•„м ё лӮҳмҷҖ кіјн•ҷкіј мӮ¬мғҒмқ„ л°ңм „мӢңнӮӨлҠ” лҸҷм•Ҳ, мҳӨмҠӨл§Ңмқҳ н•„кІҪмӮ¬л“ӨмқҖ м—¬м „нһҲ мҶҗмңјлЎң мұ…мқ„ лІ к»ҙ м“°кі мһҲм—ҲлӢӨ.
16м„ёкё°, нғҖнӮӨ м•Ң л”ҳмқҙ м„ёмҡҙ лӢ№лҢҖ мөңкі мқҳ мІңл¬ёлҢҖк°Җ "мІңмӮ¬л“Өмқҳ лӢӨлҰ¬лҘј нӣ”міҗліҙлҠ” л¶ҲкІҪн•ң 짓"мқҙлқјлҠ” мқҙмң лЎң нҢҢкҙҙлӢ№н•ң мқјнҷ”лҠ” м ңкөӯмқҙ мҠӨмҠӨлЎң лҲҲмқ„ м°”лҹ¬лІ„лҰ° кІғкіј лӢӨлҰ„м—Ҷм—ҲлӢӨ. кіјкұ°мқҳ м§ҖмӢқкіј м „нҶөмқ„ мҡ°мғҒнҷ”н•ҳлҠҗлқј, мғҲлЎңмҡҙ 진лҰ¬к°Җ л“Өм–ҙмҳ¬ м°Ҫл¬ёмқ„ лӘЁмЎ°лҰ¬ лӘ»м§Ҳн•ҙ лІ„лҰ° кІғмқҙлӢӨ. к·ё кІ°кіј лІҢм–ҙ진 300л…„мқҳ м§Җм Ғ кІ©м°ЁлҠ” к·ё м–ҙл–Ө кө°мӮ¬л ҘмңјлЎңлҸ„ л©”мҡё мҲҳ м—ҶлҠ” к№ҠмқҖ нҒ¬л Ҳл°”мҠӨк°Җ лҗҳм—ҲлӢӨ.
мҡ°мғҒмқ„ к№ЁлңЁл Өм•ј лҜёлһҳк°Җ ліҙмқёлӢӨ
мҳӨмҠӨл§Ң м ңкөӯмқҳ мҮ лқҪмқҖ лӢЁмҲңнһҲ лӮЁмқҳ лӮҳлқј мқҙм•јкё°к°Җ м•„лӢҲлӢӨ. к·ёкІғмқҖ мҳӨлҠҳмқ„ мӮҙм•„к°ҖлҠ” мҡ°лҰ¬ лӘЁл‘җм—җкІҢ лҚҳм§ҖлҠ” м„ңлҠҳн•ң м§Ҳл¬ёмқҙлӢӨ. "лӢ№мӢ мқ„ м—¬кё°к№Ңм§Җ мҳӨкІҢ н•ң к·ё м„ұкіө л°©мӢқмқҙ, лӢ№мӢ мқҳ лӮҙмқјмқ„ к°ҖлЎңл§үлҠ” кұёлҰјлҸҢмқҙ лҗҳкі мһҲм§ҖлҠ” м•ҠмқҖк°Җ?"
мҳҲлӢҲмІҙлҰ¬мқҳ мҡ©л§№н•Ё, мӢӨнҒ¬лЎңл“ңмқҳ лІҲмҳҒ, мҷ„лІҪн•ң кҙҖлЈҢм ң, кі мң н•ң л¬ёнҷ”м Ғ мһҗл¶ҖмӢ¬. мқҙ лӘЁл“ кІғмқҖ 분лӘ… м ңкөӯмқ„ мң„лҢҖн•ҳкІҢ л§Ңл“ мқјл“ұ кіөмӢ л“Өмқҙм—ҲлӢӨ. н•ҳм§Җл§Ң к·ёл“Өмқҙ к·ё м„ұкіөмқ„ 'м ҲлҢҖм Ғмқё кІғ'мңјлЎң мҡ°мғҒнҷ”н•ҳкі , ліҖнҷ”н•ҳлҠ” нҳ„мӢӨ м•һм—җм„ң к·ёкІғмқ„ кі м§‘н–Ҳмқ„ л•Ң, 축ліөмқҖ м ҖмЈјк°Җ лҗҳм—ҲлӢӨ. нҶ мқёл№„мқҳ л§җмІҳлҹј, м°ҪмЎ°м Ғмқё мҶҢмҲҳк°Җ м§Җл°°м Ғмқё мҶҢмҲҳлЎң м „лқҪн•ҳм—¬ кё°л“қк¶Ңл§Ңмқ„ м§ҖнӮӨл Ө н• л•Ң мӮ¬нҡҢлҠ” л¬ҙл„Ҳ진лӢӨ.
л§Ҳнқҗл¬ҙл“ң 2м„ёмқҳ мІҳм Ҳн•ң к°ңнҳҒмқҙлӮҳ нғ„м§Җл§ҲнҠёмқҳ лӘёл¶ҖлҰјмқҖ 비лЎқ мӢӨнҢЁлЎң лҒқлӮ¬м§Җл§Ң, мҡ°лҰ¬м—җкІҢ мӨ‘мҡ”н•ң лӢЁм„ңлҘј лӮЁкёҙлӢӨ. мӮҙкё° мң„н•ҙм„ңлҠ” кіјкұ°мқҳ лӮҳлҘј мЈҪм—¬м•ј н•ңлӢӨлҠ” кІғмқҙлӢӨ. м§„м •н•ң мғқмЎҙмқҖ кіјкұ°мқҳ мҳҒкҙ‘мқ„ л°•м ңн•ҳлҠ” кІҢ м•„лӢҲлқј, лҒҠмһ„м—Ҷмқҙ лӮЎмқҖ н—Ҳл¬јмқ„ лІ—м–ҙ лҚҳм§ҖлҠ” кі нҶөмҠӨлҹ¬мҡҙ нғҲн”јмқҳ кіјм •м—җ мһҲлӢӨ.
м§ҖкёҲ мҡ°лҰ¬ мҶҗм—җ мҘҗм–ҙ진 м„ұкіөмқҳ нҠёлЎңн”јлҘј лӢӨмӢң н•ңлІҲ л°”лқјліҙмһҗ. нҳ№мӢң мҡ°лҰ¬лҠ” к·ё нҠёлЎңн”јмқҳ кҙ‘мұ„м—җ лҲҲмқҙ л©Җм–ҙ, лӢӨк°ҖмҳӨлҠ” кұ°м№ң нҢҢлҸ„лҘј ліҙм§Җ лӘ»н•ҳкі мһҲлҠ” кІғмқҖ м•„лӢҗк№Ң. мҳӨмҠӨл§ҢмқҙлқјлҠ” кұ°мқёмқҙ лӮЁкёҙ м“ём“ён•ң л’·лӘЁмҠөмқҖ, мҳҒмӣҗн•ң 1л“ұмқҖ м—Ҷмңјл©° мҳӨм§Ғ лҒҠмһ„м—Ҷмқҙ ліҖн•ҳлҠ” мһҗл§Ңмқҙ мӮҙм•„лӮЁлҠ”лӢӨлҠ” нҸүлІ”н•ҳм§Җл§Ң, л¬ҙкұ°мҡҙ 진лҰ¬лҘј лӢӨмӢңкёҲ мқјк№ЁмӣҢ мӨҖлӢ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