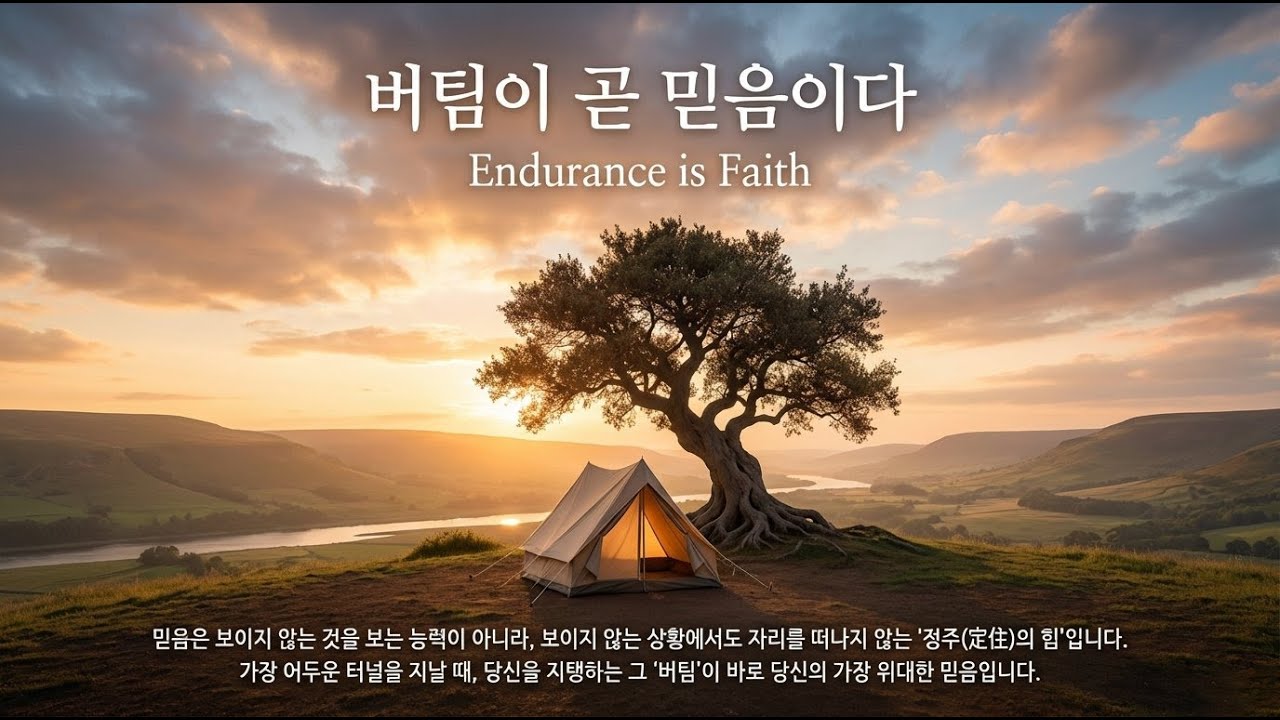лёҢлһңл“ңлҘј л§Ңл“Ө л•Ң к°ҖмһҘ л§ҺмқҖ мӢңк°„кіј 비мҡ©мқҙ нҲ¬мһ…лҗҳлҠ” мҳҒм—ӯмқҖ мқҙлҰ„кіј мӢңк°Ғ мҡ”мҶҢлӢӨ. л„Өмқҙл°Қмқ„ мң„н•ҙ мҲҳмӢӯ к°ңмқҳ нӣ„ліҙлҘј кІҖнҶ н•ҳкі , лЎңкі мҷҖ 컬лҹ¬ мӢңмҠӨн…ңмқ„ м •көҗн•ҳкІҢ лӢӨ듬лҠ”лӢӨ. к·ёлҹ¬лӮҳ нҳ„мһҘм—җм„ң кі к°қмқҙ кё°м–өн•ҳлҠ” лёҢлһңл“ңмқҳ лӘЁмҠөмқҖ м „нҳҖ лӢӨлҘё м§Җм җм—җ лЁёл¬ҙлҠ” кІҪмҡ°к°Җ л§ҺлӢӨ.
н•ң кё°м—… лҢҖн‘ңлҠ” кі к°қкіјмқҳ лҢҖнҷ”м—җм„ң мҳҲмғҒм№ҳ лӘ»н•ң лӢөліҖмқ„ л“Өм—ҲлӢӨкі м „н–ҲлӢӨ. лёҢлһңл“ң мқҙлҰ„мқҖ л– мҳӨлҘҙм§Җ м•Ҡм§Җл§Ң, к·ё кіөк°„м—җм„ң лҠҗкјҲлҚҳ 분мң„кё°мҷҖ к°җм •мқҖ лҳҗл ·н•ҳкІҢ лӮЁм•„ мһҲлӢӨлҠ” л§җмқҙм—ҲлӢӨ. вҖңкұ°кё°к°Җ мўҖ л”°лң»н–ҲлӢӨвҖқлҠ” н‘ңнҳ„мқҖ м ңн’ҲмқҙлӮҳ м„ң비мҠӨмқҳ м„ӨлӘ…ліҙлӢӨ мҳӨлһҳ кё°м–өм—җ лӮЁм•ҳлӢӨ. мқҙ кІҪн—ҳмқҖ лёҢлһңл“ңлҘј л°”лқјліҙлҠ” кҙҖм җмқ„ мҷ„м „нһҲ л°”кҫёлҠ” кі„кё°к°Җ лҗҗлӢӨ.
м „нҶөм Ғмқё кІҪмҳҒн•ҷм—җм„ңлҠ” лёҢлһңл“ңлҘј мҶҢ비мһҗк°Җ кө¬лі„н• мҲҳ мһҲлҸ„лЎқ лҸ•лҠ” мқҙлҰ„, мғҒ징, л””мһҗмқёмқҳ мЎ°н•©мңјлЎң м •мқҳн•ңлӢӨ. н•ҳм§Җл§Ң мӢӨм ң мҶҢ비мһҗ мқёмӢқмқҳ мһ‘лҸҷ л°©мӢқмқҖ лӢӨлҘҙлӢӨ. лёҢлһңл“ңлҠ” мқём§Җмқҳ лҢҖмғҒмқҙкё°ліҙлӢӨ к°җм •мқҳ 축м ҒмңјлЎң нҳ•м„ұлҗңлӢӨ. мӮ¬лһҢл“ӨмқҖ лёҢлһңл“ңлҘј 분м„қн•ҳм§Җ м•Ҡкі , лЁјм Җ лҠҗлӮҖлӢӨ.
м»Өн”ј м „л¬ём җмқ„ л– мҳ¬лҰҙ л•Ң лЎңкі ліҙлӢӨ н–Ҙмқҙ лЁјм Җ мҠӨм№ҳлҠ” мқҙмң , м „мһҗкё°кё° лёҢлһңл“ңлҘј мғқк°Ғн• л•Ң кё°лҠҘліҙлӢӨ мҙүк°җкіј мӮ¬мҡ© мҲңк°„мқҳ к°җк°Ғмқҙ лЁјм Җ л– мҳӨлҘҙлҠ” мқҙмң лҸ„ м—¬кё°м—җ мһҲлӢӨ. мқҙлҠ” мһҘкё°к°„м—җ кұёміҗ 축м Ғлҗң кІҪн—ҳмқҳ кё°м–өмқҙ н•ҳлӮҳмқҳ мқҙлҜём§ҖлЎң м ҖмһҘлҗң кІ°кіјлӢӨ.
лёҢлһңл”© кіјм •м—җм„ң л„Өмқҙл°Қмқҳ мӨ‘мҡ”м„ұмқ„ л¶Җм •н• мҲҳлҠ” м—ҶлӢӨ. л°ңмқҢ, мқҳлҜё, кІҖмғү л…ём¶ң л“ұ кі л Өн•ҙм•ј н• мҡ”мҶҢлҸ„ 분лӘ… мЎҙмһ¬н•ңлӢӨ. к·ёлҹ¬лӮҳ мӢӨм ң м„ нғқкіј мһ¬л°©л¬ёмқ„ мқҙлҒ„лҠ” кІ°м •м Ғ мҡ”мқёмқҖ мқҙлҰ„мқҙ м•„лӢҢ кІҪн—ҳмқҳ мһ”мғҒмқҙлӢӨ. кі к°қмқҖ лёҢлһңл“ңлҘј л§җлЎң м ҖмһҘн•ҳм§Җ м•ҠлҠ”лӢӨ. к°җм •кіј мһҘл©ҙмңјлЎң кё°м–өн•ңлӢӨ.
нҳ„мһҘм—җм„ң л§ҢлӮң лҳҗ лӢӨлҘё кі к°қмқҖ лёҢлһңл“ңлҘј мқҙл ҮкІҢ н‘ңнҳ„н–ҲлӢӨ. вҖңм„ӨлӘ…н•ҳкёҙ м–ҙл ӨмҡҙлҚ°, лӢӨмӢң к°Җкі мӢ¶мқҖ кіімқҙлӢӨ.вҖқ мқҙ н•ң л¬ёмһҘмқҖ лёҢлһңл“ңмқҳ ліём§Ҳмқ„ м •нҷ•нһҲ м§ҡлҠ”лӢӨ. лёҢлһңл“ңлҠ” м–ҙл””м„ң лҙӨлҠ”м§Җк°Җ м•„лӢҲлқј, мҷң лӢӨмӢң л– мҳӨлҘҙлҠ”м§ҖлЎң мҷ„м„ұлҗңлӢӨ.
кІ°көӯ лёҢлһңл“ңлһҖ м •мІҙм„ұмқҙ м•„лӢҲлқј мһ”мғҒмқҙлӢӨ. л¬ҙм—Үмқҙ мўӢм•ҳлҠ”м§Җ лӘ…нҷ•нһҲ м„ӨлӘ…н•ҳм§Җ лӘ»н•ҙлҸ„, лӢӨмӢң м„ нғқн•ҳкІҢ л§Ңл“ңлҠ” нһҳ. мқҙмң лҘј м–ём–ҙнҷ”н•ҳм§Җ лӘ»н•ҙлҸ„ л°ҳліөлҗҳлҠ” н–үлҸҷ. мқҙ л¬ҙмқҳмӢқмқҳ нқҗлҰ„мқ„ л§Ңл“ңлҠ” кІғмқҙ 진м§ң лёҢлһңл”©мқҙлӢӨ.
мқҙ кё°мӮ¬лҠ” лёҢлһңл“ңлҘј мӢңк°Ғм Ғ мһҗмӮ°мқҙлӮҳ лӘ…м№ӯ мӨ‘мӢ¬мңјлЎң л°”лқјліҙлҠ” кё°мЎҙ кҙҖм җм—җм„ң лІ—м–ҙлӮҳ, кі к°қ кІҪн—ҳкіј к°җм • кё°м–өмқҳ мӨ‘мҡ”м„ұмқ„ мЎ°лӘ…н•ңлӢӨ. кё°м—…кіј лёҢлһңл“ң лӢҙлӢ№мһҗм—җкІҢлҠ” м „лһө мҲҳлҰҪмқҳ кё°мӨҖм җмқ„ мһ¬м •л ¬н•ҳлҠ” кі„кё°лҘј м ңкіөн•ңлӢӨ.
лёҢлһңл“ңлҠ” м„ӨлӘ…мқҙ м•„лӢҲлқј кё°м–өмңјлЎң лӮЁлҠ”лӢӨ. мқҙлҰ„ліҙлӢӨ мҳӨлһҳ к°ҖлҠ” кІғмқҖ к·ё мҲңк°„мқҳ лҠҗлӮҢмқҙлӢӨ. кі к°қмқҳ л§ҲмқҢм—җ лӮЁмқҖ к°җм •мқҳ мһ”мғҒмқҙ лёҢлһңл“ңмқҳ мӢӨмІҙлӢ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