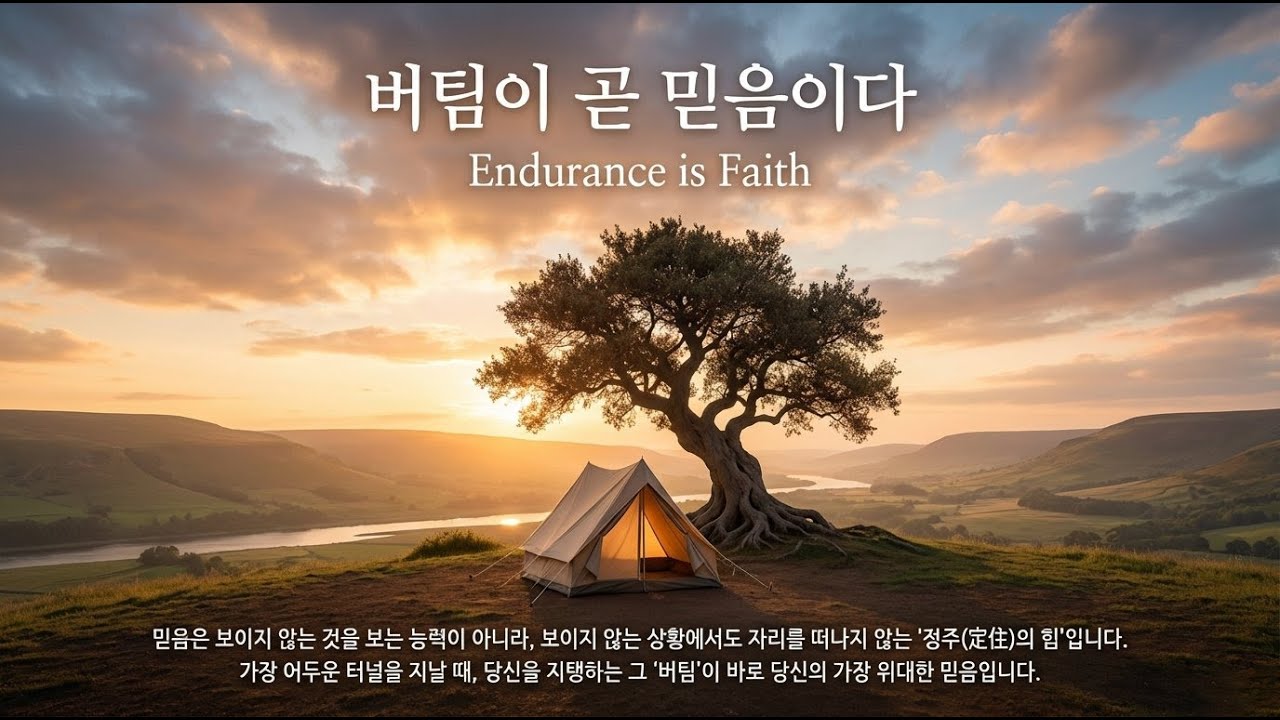‘탐험’의 이름으로 감춰진 문명의 오만
- 『마지막 거인』이 묻는 인간과 자연의 윤리
“탐험이란 결국,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다.”
프랑수아 플라스의 소설 『마지막 거인』은 이 문장을 몸소 증명하는 이야기다.
19세기, 한 영국 지리학자가 ‘거인의 이빨’이라는 신비한 유물을 손에 넣으며 시작된 여정은, 곧 문명과 인간의 오만에 대한 거대한 우화로 확장된다. 작가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경이와 호기심으로 출발한 인간의 탐험이 어떻게 파괴와 탐욕으로 변질되는지를 정교한 서사와 수채화로 기록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모험소설이 아니다. 『마지막 거인』은 문명이 자연을 향해 던지는 “정복의 시선”에 대한 반성문이며, 인간이 ‘탐험’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해온 파괴의 역사를 고발하는 생태적 선언문이다.
주인공 아치볼드 루스모어는 미지의 존재를 향한 호기심으로 여행을 시작한다. 그러나 탐험이 깊어질수록 그의 호기심은 ‘명예’와 ‘성취’라는 이름의 욕망으로 변한다.
거인의 나라를 찾아가는 여정은 곧 인간이 자연을 향해 나아가는 문명의 여정을 상징한다. 작가는 루스모어가 거인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쉽게 대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지를 드러낸다.
거인의 몸은 더 이상 신비의 상징이 아니라 ‘탐구의 대상’, 나아가 ‘상품화된 발견’으로 변한다. 결국 그는 두 번째 탐험에서, 인간의 손에 의해 멸망당한 거인들의 흔적만을 목격한다. 루스모어의 비극은 곧 인류 전체의 초상이다 — 지식을 탐하는 인간의 손이 결국 자신이 서 있는 대지를 무너뜨린 것이다.
『마지막 거인』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는 인간의 태도를 비판한다.
루스모어가 ‘거인의 나라’를 발견하고 돌아온 뒤 백과사전을 편찬해 성공을 거두는 대목은, 지식이 어떻게 ‘권력’으로 변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연은 기록되고, 분류되고, 평가된다. 그러나 그것은 존중이 아닌 통제다.
이 대목에서 작가는 묻는다. “지식은 언제부터 윤리를 잃었는가?”
그의 질문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인공지능, 유전자 조작, 환경 개발 등 문명은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할수록 윤리적 책임에서 멀어진다. 『마지막 거인』은 ‘탐험’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윤리의 붕괴를 통렬히 드러내며, 지식의 폭력성을 고발한다.
한국어판 서문에서 최재천 교수는 “자연에게 길은 곧 죽음이다”라는 표현으로 인간의 탐욕을 비판했다.
그는 반딧불이와 희귀조류 ‘호사도요’를 예로 들며, 우리가 자연을 ‘보여주기 위해’ 드러내는 순간 자연은 이미 상처 입는다고 말한다. 이는 『마지막 거인』의 핵심 메시지와 맞닿는다. 거인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려는’ 순간, 거인은 멸망한다.
인간은 언제나 발견과 보호 사이에서 갈등해왔다. 그러나 그 경계가 무너진 오늘, ‘거인의 나라’는 이미 사라진 숲의 은유가 되었다. 작가는 그 상실의 순간을 기록함으로써 독자에게 묻는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잃을 것인가?”
『마지막 거인』은 1992년 출간된 이후 30년이 넘도록 사랑받아 왔다. 그 이유는 단순히 아름다운 수채화나 모험의 서사 때문이 아니다.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거인은 더 이상 신화의 존재가 아니다. 거인은 곧 ‘자연’, ‘지구’,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는 ‘윤리’다.
프랑수아 플라스는 인간이 자연을 배반하는 순간, 스스로의 존재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경고한다.
‘탐험’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매력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 속에 감춰진 오만을 직시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발견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
거인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침묵 속에서 인류의 양심은 여전히 깨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