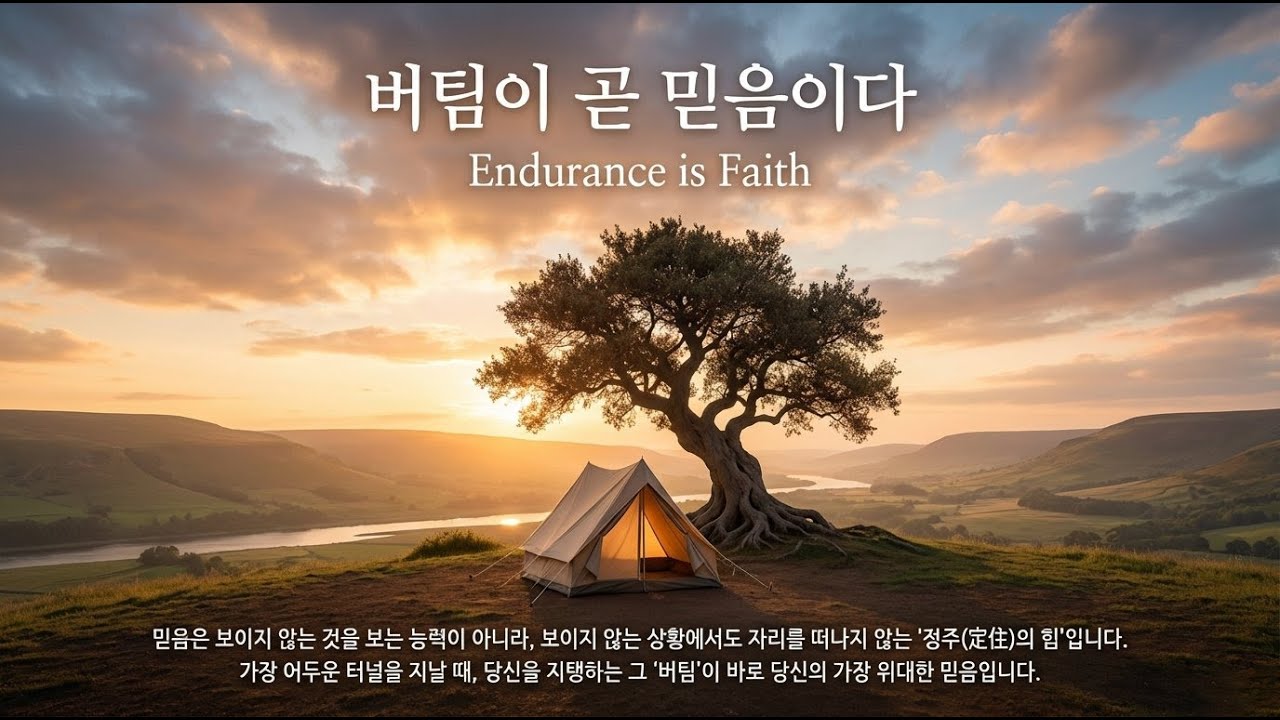н•ңкөӯм „л ҘкіөмӮ¬(мқҙн•ҳ н•ңм „)лҠ” мөңк·ј м§Җм—ӯмӮ¬нҡҢкіөн—Ң мқём •м ңм—җм„ң кіөкё°м—… мөңмҙҲлЎң ліёмӮ¬мҷҖ м „көӯ 15к°ң м§Җм—ӯліёл¶Җк°Җ 3л…„ м—°мҶҚ мҡ°мҲҳкё°кҙҖмңјлЎң м„ м •лҗҳл©° нҷ”л Өн•ң м„ұкіјлҘј кё°лЎқн–ҲлӢӨ. ліҙкұҙліөм§Җл¶Җ мһҘкҙҖмғҒ мҲҳмғҒ, кё°нӣ„мң„кё° лҢҖмқ‘ мӮ¬м—…, LED көҗмІҙ, м·Ём•Ҫкі„мёө м§Җмӣҗ л“ұ лҢҖмҷём ҒмңјлЎңлҠ” лӘЁлІ”м Ғмқё ESG кіөкё°м—…мқҳ мғҒ징мІҳлҹј 비춰진лӢӨ. к·ёлҹ¬лӮҳ мқҙлҹ° мҲҳмғҒ лӮҙм—ӯкіј нҷҚліҙ мһҗлЈҢмқҳ мқҙл©ҙм—җлҠ”, м—¬м „нһҲ вҖҳкё°кі„м Ғ лӢЁм „ н–үм •вҖҷмңјлЎң кі нҶөл°ӣлҠ” мҶҢмғҒкіөмқёмқҳ нҳ„мӢӨмқҙ кіөмЎҙн•ңлӢӨ.
мөңк·ј м„ңмҡё м„ңлҢҖл¬ёкө¬(н•ңм „ мқҖнҸүм§ҖмӮ¬ кҙҖн• м§Җм—ӯ)м—җм„ң мӢӨм ңлЎң л°ңмғқн•ң н•ңм „ мқҖнҸүм§ҖмӮ¬ кҙҖн• м№ҙнҺҳ лӢЁм „ мӮ¬лЎҖлҠ” мқҙлҹ¬н•ң лӘЁмҲңмқ„ м ҒлӮҳлқјн•ҳкІҢ ліҙм—¬мӨҖлӢӨ. н•ҙлӢ№ м№ҙнҺҳлҠ” кІҪкё° м№ЁмІҙмҷҖ кі м •л№„ л¶ҖлӢҙмқҙ кІ№м№ҳл©° мҲҳк°ңмӣ”к°„ м „кё°мҡ”кёҲ мІҙлӮ© мғҒнғңм—җ лҶ“мҳҖкі , мқҙнӣ„ м•ҲлӮҙ л¬ёмһҗмҷҖ кі м§Җм„ң л°ңмҶЎ, лӢЁм „ мҳҲкі нҶөліҙлҘј кұ°міҗ м „л Ҙ м°ЁлӢЁмқҙ 집н–үлҗҗлӢӨ. л¬ём ңлҠ” мқҙ кіјм •мқҙ мІ м ҖнһҲ вҖҳл§Өлүҙм–ј мӨ‘мӢ¬мқҳ мһҗлҸҷнҷ” н”„лЎңм„ёмҠӨвҖҷлЎңл§Ң мҡҙмҡ©лҗҗлӢӨлҠ” м җмқҙлӢӨ. мҳҒм—… нҳ„мӢӨ, 분лӮ© к°ҖлҠҘм„ұ, л§Өм¶ң нҡҢліө м—¬л¶Җм—җ лҢҖн•ң мӢӨм§Ҳм Ғ мғҒлӢҙмқҙлӮҳ мЎ°м • м Ҳм°ЁлҠ” мӮ¬мӢӨмғҒ нҳ•мӢқм—җ к·ёміӨлӢӨ.
м „кё°к°Җ лҒҠкёҙ мҲңк°„, м№ҙнҺҳлҠ” кі§л°”лЎң мҳҒм—… л¶ҲлҠҘ мғҒнғңк°Җ лҗҗлӢӨ. лғүмһҘВ·лғүлҸҷ ліҙкҙҖмқҙ мӨ‘лӢЁлҗҳл©ҙм„ң мӢқмһҗмһ¬лҠ” нҸҗкё° лҢҖмғҒмқҙ лҗҳм—Ҳкі , POSмҷҖ кІ°м ң мӢңмҠӨн…ңмқҙ лҸҷмӢңм—җ л©Ҳм·„лӢӨ. кі к°қ мӢ лў°лҠ” н•ҳлЈЁм•„м№Ём—җ л¬ҙл„ҲмЎҢкі , вҖңмһ мӢң мү¬лҠ” мӨ‘мһ…лӢҲлӢӨвҖқлқјлҠ” м•ҲлӮҙ л¬ёкө¬лЎңлҠ” мғҒк¶Ңм—җм„ңмқҳ мӢ мҡ© н•ҳлқҪмқ„ л§үкё° м–ҙл Өмӣ лӢӨ. мІҙлӮ©м—җ лҢҖн•ң мұ…мһ„мқҖ мӮ¬м—…мһҗм—җкІҢ 분лӘ…нһҲ мһҲм§Җл§Ң, вҖҳлӢЁм „вҖҷмқҙлқјлҠ” л°©мӢқмқҙ кіјм—° м§ҖкёҲ мӢңлҢҖм—җ н•©лҰ¬м Ғ м ңмһ¬ мҲҳлӢЁмқём§Җм—җ лҢҖн•ң мқҳл¬ёмқҙ м ңкё°лҗҳлҠ” мқҙмң лӢӨ.
н•ңм „мқҖ мҠӨмҠӨлЎңлҘј вҖҳм—җл„Ҳм§Җ м·Ём•Ҫкі„мёөмқ„ ліҙнҳён•ҳлҠ” кіөкё°м—…вҖҷмңјлЎң к·ңм •н•ҳл©° к°Ғмў… мӮ¬нҡҢкіөн—Ң нҷңлҸҷмқ„ к°•мЎ°н•ңлӢӨ. к·ёлҹ¬лӮҳ нҳ„мӢӨмқҳ мҶҢмғҒкіөмқёмқҖ м—¬м „нһҲ вҖҳмҡ”кёҲ мІҙлӮ©мһҗвҖҷлЎңл§Ң 분лҘҳлҗңлӢӨ. мҪ”лЎңлӮҳ мқҙнӣ„ лҲ„м Ғлҗң л¶Җмұ„, мһ„лҢҖлЈҢ мғҒмҠ№, мқёкұҙ비 л¶ҖлӢҙ мҶҚм—җм„ң мһҗмҳҒм—…мһҗлҠ” мқҙлҜё кө¬мЎ°м Ғ м·Ём•Ҫкі„мёөмқҙ лҗҳм—ҲлӢӨ. к·ёлҹјм—җлҸ„ нҳ„мһҘм—җм„ңлҠ” 분лӮ©В·мң мҳҲВ·кІҪмҳҒнҡҢліө м—°кі„ к°ҷмқҖ вҖҳнҡҢмғқ мӨ‘мӢ¬мқҳ м—җл„Ҳм§Җ ліҙнҳё лӘЁлҚёвҖҷмқҙ м•„лӢҢ, мұ„к¶Ң нҡҢмҲҳ мӨ‘мӢ¬мқҳ кө¬мӢңлҢҖм Ғ лӢЁм „ мӢңмҠӨн…ңмқҙ л°ҳліөлҗҳкі мһҲлӢӨ.
нҠ№нһҲ вҖҳлӢЁм „л°ҳвҖҷмқҙлқјлҠ” мЎ°м§Ғ лӘ…м№ӯ мһҗмІҙк°Җ мғҒ징н•ҳлҠ” н–үм • л§Ҳмқёл“ңлҸ„ л¬ём ңлӢӨ. л””м§Җн„ё кІҪм ң мӢңлҢҖм—җ м „кё°лҠ” мғқмЎҙ мқён”„лқјмқҙмһҗ кіөкіөмһ¬м—җ к°Җк№қлӢӨ. м „л Ҙ м°ЁлӢЁмқҖ лӢЁмҲңн•ң м„ң비мҠӨ мӨ‘лӢЁмқҙ м•„лӢҲлқј, мҶҢмғҒкіөмқём—җкІҢлҠ” вҖҳмҳҒм—…к¶Ң л°•нғҲвҖҷмқҙл©° вҖҳмғқкі„ лӢЁм ҲвҖҷм—җ н•ҙлӢ№н•ңлӢӨ. мқҖнҸүм§ҖмӮ¬ мӮ¬лЎҖлҠ” мқҙ м ңлҸ„к°Җ м—¬м „нһҲ кіөкёүмһҗ мӨ‘мӢ¬, нҡҢмҲҳ мӨ‘мӢ¬ л…јлҰ¬м—җм„ң лІ—м–ҙлӮҳм§Җ лӘ»н•ҳкі мһҲмқҢмқ„ ліҙм—¬мЈјлҠ” лҢҖн‘ңм Ғ мһҘл©ҙмқҙлӢӨ.
лҚ” нҒ° л¬ём ңлҠ” мқҙлҹ¬н•ң лӢЁм „ мЎ°м№ҳк°Җ м§Җм—ӯкІҪм ң м „л°ҳм—җ м—°мҮ„м ҒмңјлЎң лҜём№ҳлҠ” нҢҢмһҘмқҙлӢӨ. м№ҙнҺҳ н•ң кіімқҳ л¶Ҳмқҙ кәјм§Җл©ҙ, к·ё мЈјліҖ мғҒк¶Ңмқҳ мң лҸҷ мқёкө¬лҸ„ к°җмҶҢн•ңлӢӨ. лҸҷл„Өмқҳ мһ‘мқҖ мғҒм җ н•ҳлӮҳлҠ” нҶөкі„м—җ мһЎнһҲм§Җ м•Ҡм§Җл§Ң, к·ё л¶Ҳл№ӣмқҙ кәјм§Ҳ л•Ң м§Җм—ӯмӮ¬нҡҢлҠ” мЎ°мҡ©нһҲ м№ЁмІҙлҗңлӢӨ. м§Җм—ӯмӮ¬нҡҢ кіөн—Ңмқ„ мҷём№ҳлҠ” н•ңм „мқҙ м •мһ‘ м§Җм—ӯ мғҒк¶Ңмқҳ вҖҳмғқмЎҙ м—җл„Ҳм§ҖвҖҷм—җлҠ” м§ҖлӮҳм№ҳкІҢ м—„кІ©н•ң мһЈлҢҖлҘј л“ӨмқҙлҢҖкі мһҲлӢӨлҠ” 비нҢҗмқҙ лӮҳмҳӨлҠ” мқҙмң лӢӨ.
кіөкё°м—…мқҳ мӮ¬нҡҢм Ғ мұ…мһ„мқҖ вҖҳмҲҳмғҒ мӢӨм ҒвҖҷмқҙ м•„лӢҲлқј мң„кё° мғҒнҷ©м—җм„ңмқҳ м„ нғқкіј нғңлҸ„лЎң мҰқлӘ…лҗңлӢӨ. лӢЁм „мқҖ мөңнӣ„мқҳ мҲҳлӢЁмқҙм–ҙм•ј н•ҳл©°, к·ё мқҙм „ лӢЁкі„м—җм„ң в–ІмӢӨм§Ҳм Ғ 분лӮ© нҳ‘мқҳ в–Іл§Өм¶ң нҡҢліө к°ҖлҠҘм„ұ нҸүк°Җ в–ІмӨ‘мҶҢлІӨмІҳл¶ҖВ·м§ҖмһҗмІҙмҷҖ м—°кі„н•ң м—җл„Ҳм§Җ кёҲмңө м§Җмӣҗ в–ІмҶҢмғҒкіөмқё л§һм¶Өнҳ• м „кё°мҡ”кёҲ мҷ„нҷ” н”„лЎңк·ёлһЁ л“ұмқҙ н•Ёк»ҳ мһ‘лҸҷн•ҙм•ј н•ңлӢӨ. мқҖнҸүм§ҖмӮ¬ мӮ¬лЎҖмІҳлҹј кё°кі„м Ғ лӢЁм „мқҙ л°ҳліөлҗңлӢӨл©ҙ, н•ңм „мқҳ ESGлҠ” нҳ„мһҘм—җм„ң кіөн—Ҳн•ң кө¬нҳёлЎңл§Ң лӮЁмқ„ мҲҳл°–м—җ м—ҶлӢӨ.
н•ңм „мқҖ м§ҖкёҲ мӨ‘мҡ”н•ң кё°лЎңм—җ м„ң мһҲлӢӨ. м§Җм—ӯмӮ¬нҡҢкіөн—Ң мҡ°мҲҳкё°кҙҖмқҙлқјлҠ” лӘ…мҳҲлҘј вҖҳнҳ„мһҘмқҳ мӢ лў°вҖҷлЎң нҷ•мһҘн• кІғмқёк°Җ, м•„лӢҲл©ҙ мҲҳмғҒкіј нҳ„мӢӨмқҳ кҙҙлҰ¬лҘј л°ҳліөн•ҳлҠ” кіөкё°м—…мңјлЎң лӮЁмқ„ кІғмқёк°Җ. мҶҢмғҒкіөмқёмқҙ мІҙлӮ©мһҗк°Җ лҗҳкё° м „м—җ мқҙлҜё мң„кё°м—җ мІҳн•ҙ мһҲлӢӨлҠ” мӮ¬мӢӨмқ„ мқём •н•ҳм§Җ м•ҠлҠ” н•ң, лӢЁм „л°ҳ мҡҙмҳҒмқҖ м•һмңјлЎңлҸ„ лҒҠмһ„м—ҶлҠ” мӮ¬нҡҢм Ғ к°Ҳл“ұмқҳ л¶Ҳм”Ёк°Җ лҗ кІғмқҙлӢӨ.
м§„м •н•ң м—җл„Ҳм§Җ кіөкё°м—…мқҙлқјл©ҙ, мқҙм ң 묻лҠ” л°©мӢқл¶Җн„° л°”лҖҢм–ҙм•ј н•ңлӢ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