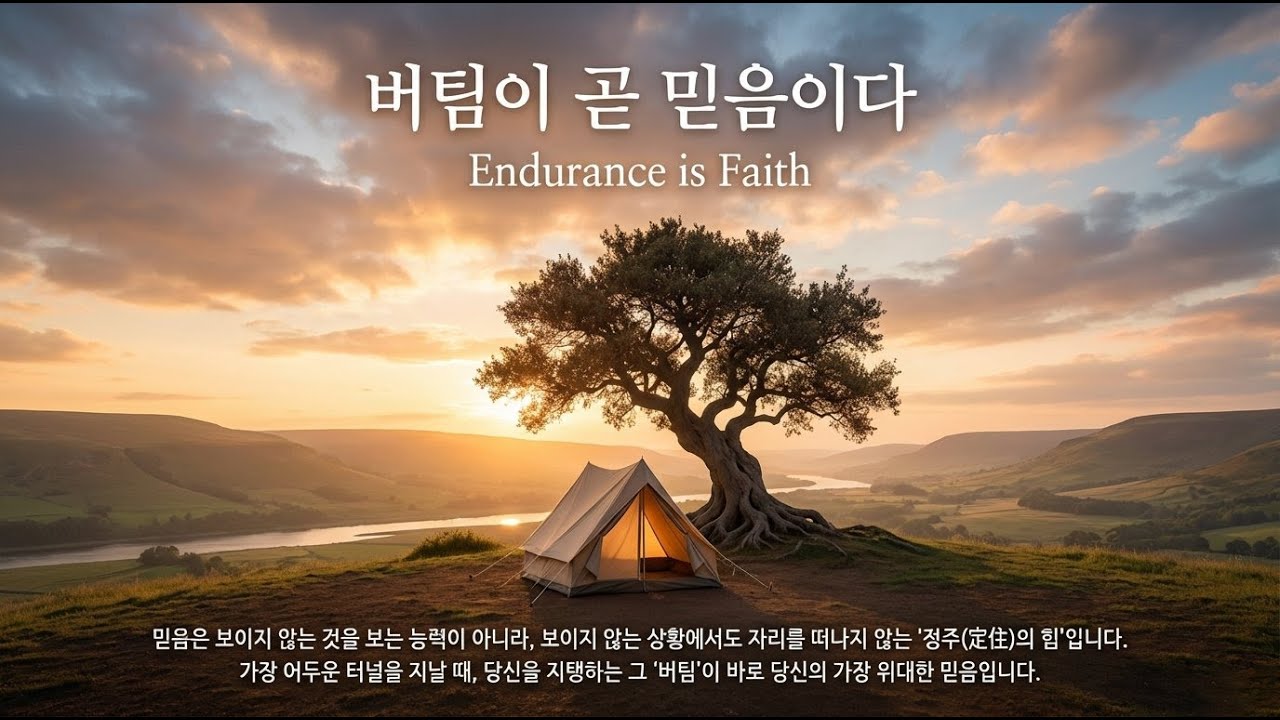Žįēž†úŽźú žóįŽĆÄÍłįžóźžĄú žāīžēĄžěąŽäĒ ŪēŹž§ĄŽ°ú
ŪēôžįĹ žčúž†ą žöįŽ¶¨žóźÍ≤Ć 'žĄłÍ≥Ąžā¨'ŽěÄ žąėŽ©īž†úžôÄ Žč§Ž¶ĄžóÜžóąŽč§. "1492ŽÖĄ žĹúŽüľŽ≤Ąžä§, 1517ŽÖĄ Ž£®ŪĄį..." ŽįĎž§ĄžĚĄ ÍłčÍ≥† žôłžöįŽćė Í∑ł žąęžěźŽď§ žā¨žĚīžóźŽäĒ žĚłÍįĄžĚė ž≤īžė®žĚī žóÜžóąŽč§. Í∑łÍĪī ŽßąžĻė ž£ĹžĚÄ žěźŽď§žĚė Ž¨ėŽĻĄŽ™ÖžĚĄ žôłžöįŽäĒ žĚľž≤ėŽüľ ÍĪīž°įŪēėÍ≥† Ūô©ŽüČŪĖąŽč§. Í∑łŽüįŽćį žĶúÍ∑ľ, žĄúžě¨žĚė ŪēúÍĶ¨žĄĚžóźžĄú žöįžóįŪěą žßĎžĖī Žď† žā¨žĚīŪ܆ Žč§žĻīžčúžĚė žĪÖžĚÄ Žāī žēąžóź ž£ĹžĖīžěąŽćė žó≠žā¨ žĄłŪŹ¨Ž•ľ žĚľÍĻ®žõ†Žč§.
Í∑łŽäĒ ŽßźŪēúŽč§. žó≠žā¨ŽäĒ žóįŽŹĄžôÄ žā¨ÍĪīžĚė ŽāėžóīžĚī žēĄŽčąŽĚľ, žĚłÍįĄžĚė Žú®ÍĪįžöī 'Íįźž†ē'žĚī ŽĻöžĖīŽāł ÍĪįŽĆÄŪēú ŽďúŽĚľŽßąŽĚľÍ≥†. žöēŽßĚ, Ž™®ŽćĒŽčąž¶ė, ž†úÍĶ≠ž£ľžĚė, Ž™¨žä§ŪĄį, žĘÖÍĶź. žĚī Žč§žĄĮ ÍįÄžßÄ ŪěėžĚī ŽįĒŽ°ú žĄłÍ≥ĄŽĚľŽäĒ ÍĪįŽĆÄŪēú ÍłįÍ≥ĄŽ•ľ ŽŹĆŽ¶¨ŽäĒ žóĒžßĄžĚīžóąŽč§. žĪ֞앞̥ ŽĄėÍłįŽ©į ŽāėŽäĒ ž†Ąžú®ŪĖąŽč§. žĚīÍ≤ÉžĚÄ Ž®ľ Í≥ľÍĪįžĚė žĚīžēľÍłįÍįÄ žēĄŽčąŽĚľ, žė§Žäė žēĄžĻ®, ŽāīÍįÄ Žßąžč† žĽ§ŪĒľ Ūēú žěĒžóź, ŽāīÍįÄ Ž¨īžč¨žĹĒ ŪĀīŽ¶≠Ūēú žä§ŽßąŪäłŪŹį ŪôĒŽ©ī žÜćžóź, Í∑łŽ¶¨Í≥†, Žāī žėĀŪėľžĚī ÍįąŽßĚŪēėŽäĒ ÍĶ¨žõźžĚė Ž¨łž†ú žÜćžóź žó¨ž†ĄŪěą žāīžēĄ žą® žČ¨Í≥† žěąžóąÍłį ŽēĆŽ¨łžĚīŽč§.
Í≤ÄžĚÄ žöēŽßĚžĚė žē°ž≤ī, Í∑łŽ¶¨Í≥† žěźŽ≥łžĚė žßąž£ľ
žÉąŽ≤ĹÍłįŽŹĄŽ•ľ Žč§ŽÖÄžôÄ Ž™ĹŽ°ĪŪēú ž†ēžč†žĚĄ ÍĻ®žöįŽ†§ žäĶÍīÄž≤ėŽüľ žĽ§ŪĒľŽ•ľ ŽāīŽ¶įŽč§. ŪĖ•ÍłčŪēú žēĄŽ°úŽßąÍįÄ Ūćľžßą ŽēĆ, ŽāėŽäĒ Ž¨łŽďĚ 17žĄłÍłį žú†ŽüĹžĚė žĖīŽäź žĽ§ŪĒľŪēėžöįžä§Ž•ľ ŽĖ†žė¨Ž¶įŽč§. ž†ÄžěźžĚė ŪÜĶžįįŽĆÄŽ°ú, žĽ§ŪĒľŽäĒ Žč®žąúŪēú ÍłįŪėłŪíąžĚī žēĄŽčąžóąŽč§. Í∑łÍ≤ÉžĚÄ ž§ĎžĄłžĚė ŽāėŽ•łŪē®žĚĄ ÍĻ®žöįÍ≥† Í∑ľŽĆÄŽĚľŽäĒ 'žÜ掏ĄžĚė žčúŽĆÄ'Ž°ú žßĄžěÖŪēėÍ≤Ć Ūēú ÍįēŽ†•Ūēú ÍįĀžĄĪž†úžėÄŽč§.
ŪēėžßÄŽßĆ, Í∑ł ÍįĀžĄĪžĚė žĚīŽ©īžóźŽäĒ žĄúŽäėŪēú Í∑łŽäėžĚī žěąŽč§. žöįŽ¶¨ÍįÄ ŽąĄŽ¶¨ŽäĒ žĚī ŪĖ•ÍłįŽ°úžöī Ž¨łŽ™ÖžĚÄ ŪĒĆŽěúŪÖĆžĚīžÖė ŽÜćžě•žóźžĄú žį©ž∑®ŽčĻŪēú ŪĚϞ̳ ŽÖłžėąŽď§žĚė ŪĒľžôÄ ŽēÄ, ž¶Č 'ŽčąÍ∑łŽ°úžĚė ŽēÄ' žúĄžóź žĄłžõĆž°ĆŽč§. Ž©ąž∂ĒžßÄ žēäÍ≥† žĚľŪēėÍ≤Ć ŪēėŽäĒ žĽ§ŪĒľžĚė ŪěėžĚÄ žěźŽ≥łž£ľžĚėŽĚľŽäĒ ÍĪįŽĆÄŪēú ÍłįÍīÄžį®Ž•ľ Žč¨Ž¶¨Í≤Ć ŪĖąžßÄŽßĆ, ŽŹôžčúžóź žĚłÍįĄžĚĄ Ž∂ÄžÜćŪíąžúľŽ°ú ž†ĄŽĚĹžčúžľįŽč§.
ŽāėŽäĒ žĚī ŽĆÄŽ™©žóźžĄú žĚłÍįĄžĚė 'ž†Ąž†Ā ŪÉÄŽĚĹ(Total Depravity)'žĚĄ Ž≥łŽč§. ŪēėŽāėŽčėžĚī ž£ľžč† žěźžóįžĚė žĄ†Ž¨ľžĚĄ žĚłÍįĄžĚÄ ŪÉźžöēžĚė ŽŹĄÍĶ¨Ž°ú Ž≥ÄžßąžčúžľįŽč§. žė§ŽäėŽā† žöįŽ¶¨ŽŹĄ Žßąžį¨ÍįÄžßÄŽč§. 'žĄĪÍ≥Ķ'žĚīŽĚľŽäĒ Žč¨žĹ§Ūēú žĻīŪéėžĚłžóź ž∑®Ūēī, žĚīžõÉžĚė Í≥†ŪÜĶžĚĄ žôłŽ©īŪēú žĪĄ ŪŹ≠ž£ľŪēėÍ≥† žěąžßÄŽäĒ žēäžĚÄÍįÄ? žĽ§ŪĒľžěĒžĚĄ Žď† žÜźžĚī Ž∂ÄŽĀĄŽü¨žõĆžßÄŽäĒ žąúÍįĄžĚīŽč§.
žěÉžĖīŽ≤ĄŽ¶į žÜĆŽ™Ö: ŪĒĄŽ°úŪÖĆžä§ŪÉĄŪäł žú§Ž¶¨žôÄ žěźŽ≥łž£ľžĚėžĚė žä¨ŪĒą Í≤įŽ≥Ą
ŽßČžä§ Ž≤†Ž≤ĄÍįÄ žßÄž†ĀŪĖąŽďĮ, žěźŽ≥łž£ľžĚėŽĚľŽäĒ ÍīīŽ¨ľžĚÄ žēĄžĚīŽü¨ŽčąŪēėÍ≤ĆŽŹĄ ÍįÄžě• Í≤ĹÍĪīŪēú 'Íłąžöē'žĚė ŽĪÉžÜćžóźžĄú ŪÉúžĖīŽā¨Žč§. žĘÖÍĶź ÍįúŪėĀÍįĎ吏ĚÄ Ž™®Žď† žßĀžóÖžĚī ŪēėŽāėŽčėžĚė ÍĪįŽ£©Ūēú Ž∂ÄŽ•īžč¨, ž¶Č 'žÜĆŽ™Ö(Calling)'žĚīŽĚľÍ≥† ÍįÄŽ•īž≥§Žč§. ÍĶ¨ŽĎźŽ•ľ ÍĻĀŽäĒ žĚľŽŹĄ, Žį≠žĚĄ ÍįÄŽäĒ žĚľŽŹĄ ŪēėŽāėŽčėÍĽė žėĀÍīĎžĚī Žź† žąė žěąžóąŽč§. Í∑łŽď§žĚÄ Ž≤ĆžĖīŽď§žĚł ŽŹąžĚĄ, žĺĆŽĚŞ̥ žúĄŪēī žďįžßÄ žēäÍ≥† Žč§žčú Ūą¨žěźŪĖąŽč§. Í∑ł ÍĪįŽ£©Ūēú ž†ąž†úÍįÄ žěźŽ≥ł ž∂ēž†ĀžĚė žčúžīąÍįÄ ŽźėžóąŽč§.
Í∑łŽü¨Žāė žßÄÍłąžĚÄ žĖīŽĖ†ŪēúÍįÄ? 'žėĀŪėľ'žĚÄ ž¶ĚŽįúŪēėÍ≥† 'ÍĽćŽćįÍłį'ŽßĆ Žā®žēėŽč§. ŽÖłŽŹôžĚÄ ŽćĒ žĚīžÉĀ žÜĆŽ™ÖžĚī žēĄŽčąŽĚľ žÉĚž°ī žąėŽč®žĚī ŽźėžóąÍ≥†, Ž∂ÄžĚė ž∂ēž†ĀžĚÄ ŪēėŽāėŽčėžĚė žėĀÍīĎžĚī žēĄŽčąŽĚľ ŽāėžĚė Í≥ľžčúŽ•ľ žúĄŪēú žąėŽč®žúľŽ°ú Ž≥ÄžßąŽźėžóąŽč§. žöįŽ¶¨ŽäĒ žĻľŽĪÖžĚī ŽßźŪēú Í∑ł žĻėžóīŪēú Í≤ĹÍĪīŪē®žĚĄ žěäžĖīŽ≤ĄŽ¶¨Í≥†, Í∑łž†Ä ŽŹąžĚīŽĚľŽäĒ žöįžÉĀ(Mammon) žēěžóź ž†ąŪēėŽäĒ ŽÖłžėąÍįÄ ŽźėžĖīŽ≤ĄŽ¶į Í≤ÉžĚÄ žēĄŽčĆÍįÄ. žó≠žā¨ŽäĒ žöįŽ¶¨žóźÍ≤Ć Ž¨ĽŽäĒŽč§. ŽčĻžč†žĚė žĄĪžč§Ūē®žĚÄ Ž¨īžóážĚĄ ŪĖ•Ūēú Í≤ɞ̳ÍįÄ? ŪēėŽäėžĚė žÉĀͳȞ̳ÍįÄ, žēĄŽčąŽ©ī žĚī ŽēÖžĚė žā¨ŽĚľžßą Ž®ľžßĞ̳ÍįÄ?
žčúžĄ†žĚė Í∂ĆŽ†•: žč†žĚė ŽąąžĚĄ ŽĆÄž≤īŪēú žēĆÍ≥†Ž¶¨ž¶ė
ž§ĎžĄłžóźŽäĒ ŽĚľŪčīžĖī žĄĪÍ≤Ş̥ ŽŹÖž†źŪēú žā¨ž†úŽď§žĚī Í∂ĆŽ†•žĚĄ ž•źžóąŽč§Ž©ī, ŪėĄŽĆÄŽäĒ 'Ž≥īŽäĒ žěź'ÍįÄ žßÄŽįįŪēúŽč§. ž†ÄžěźŽäĒ Ž•īŽĄ§žÉĀžä§žĚė žõźÍ∑ľŽ≤ēžóźžĄú žčúžěĎŽźú 'žčúžĄ†žĚė Í∂ĆŽ†•'žĚī žė§ŽäėŽā† ÍĶ¨ÍłÄÍ≥ľ ÍįôžĚÄ ÍĪįŽĆÄ IT ÍłįžóÖžúľŽ°ú žĚīžĖīž°ĆŽč§Í≥† ÍŅįŽöęžĖī Ž≥łŽč§.
žöįŽ¶¨ŽäĒ Ū鳎¶¨Ūē®žĚĄ ŽĆÄÍįÄŽ°ú žöįŽ¶¨žĚė Ž™®Žď† ž∑®ŪĖ•, ŽŹôžĄ†, žöēŽß̞̥ Í≤ÄžÉČžįĹžóź ŪĄłžĖīŽÜďŽäĒŽč§. žĚīÍ≤ÉžĚÄ ŪėĄŽĆÄŪĆź 'ŪĆźžėĶŪčįžĹė(Panopticon)'žĚīŽč§. ŽāėŽäĒ žĚī žßÄž†źžóźžĄú žĄ¨Žú©Ūēú žėĀž†Ā žúĄÍłįÍįźžĚĄ ŽäźŽāÄŽč§. žöįŽ¶¨žĚė Ž™®Žď† Í≤ɞ̥ ÍįźžįįŪēėžčúŽäĒ Ž∂ĄžĚÄ žė§žßĀ žó¨ŪėłžôÄ ŪēėŽāėŽčė Ūēú Ž∂ĄžĚīžÖĒžēľ ŪēúŽč§(žčúŪéł 139Ūéł). Í∑łŽü¨Žāė žė§ŽäėŽā† žöįŽ¶¨ŽäĒ Ž≥īžĚīžßÄ žēäŽäĒ žēĆÍ≥†Ž¶¨ž¶ėžĚīŽĚľŽäĒ 'ŽĒĒžßÄŪĄł žč†'žóźÍ≤Ć žöįŽ¶¨žĚė ŽßąžĚƞ̥ Žß§žĚľ Í≥†ŽįĪŪēėÍ≥† žěąŽč§.
žĚī ÍĪįŽĆÄŪēú ž†ēŽ≥ī ž†úÍĶ≠ž£ľžĚė žēěžóźžĄú žöįŽ¶¨ŽäĒ ÍĻ®žĖī žěąžĖīžēľ ŪēúŽč§. ŽāėžĚė ŽāīŽ©īžĚĄ žĪĄžöįŽäĒ Í≤ÉžĚī žä§ŽßąŪäłŪŹįžĚė ž∂Ēž≤ú Ž™©Ž°ĚžĚłÍįÄ, žēĄŽčąŽ©ī ŽßźžĒÄžĚė Ž¨ĶžÉĀžĚłÍįÄ? 'Ž≥īŽäĒ Í∂ĆŽ†•'žóź žĘÖžÜ掟† Í≤ɞ̳ÍįÄ, žēĄŽčąŽ©ī 'Ž≥īžčúŽäĒ ŪēėŽāėŽčė' žēěžóź Žč®ŽŹÖžěźŽ°ú žĄ§ Í≤ɞ̳ÍįÄ?
ÍīĎžēľžóźžĄú žôłžĻėŽäĒ žÜĆŽ¶¨: Ž™¨žä§ŪĄįžôÄ žĚīžä¨Žěƞ̥ ŪĖ•Ūēú žÉąŽ°úžöī žčúžĄ†
20žĄłÍłįŽäĒ žěźŽ≥łž£ľžĚė, žā¨ŪöĆž£ľžĚė, ŪĆĆžčúž¶ėžĚīŽĚľŽäĒ žĄł ŽßąŽ¶¨ 'Ž™¨žä§ŪĄį'žĚė ž†ĄžüĀŪĄįžėÄŽč§. žā¨ŪöĆž£ľžĚėÍįÄ žč§ŪĆ®Ūēú žõźžĚłžĚÄ Ž™ÖŽįĪŪēėŽč§. žĚłÍįĄžĚė 'ž£ĄžĄĪ(žöēŽßĚ)'žĚĄ Ž¨īžčúŪēėÍ≥† žĚłÍ≥Ķž†ĀžĚł ŽāôžõźžĚĄ ÍĪīžĄ§ŪēėŽ†§ ŪĖąÍłį ŽēĆŽ¨łžĚīŽč§. ŽįĒŽ≤®ŪÉϞ̥ žĆďžúľŽ†§Žćė žĚłÍįĄžĚė ÍĶźŽßĆžĚī Ž¨īŽĄąžßĄ Í≤ÉÍ≥ľ ÍįôŽč§. ŽįėŽ©ī žěźŽ≥łž£ľžĚėŽäĒ žĚłÍįĄžĚė žöēŽß̞̥ Ž®ĻžĚī žāľžēĄ žāīžēĄŽā®žēėŽč§.
Í∑łŽ¶¨Í≥†, žó¨Íłįžóź 'žĚīžä¨ŽěĆ'žĚīŽĚľŽäĒ Žėź ŪēėŽāėžĚė ÍĪįŽĆÄŪēú ž∂ēžĚī žěąŽč§. žĄúÍĶ¨ ŽĮłŽĒĒžĖīŽäĒ Í∑łŽď§žĚĄ Ūēú žÜźžóź žĻľžĚĄ, Ūēú žÜźžóź žĹĒŽěĞ̥ Žď† ŪÖĆŽü¨Ž¶¨žä§Ū䳎°ú Ž¨ėžā¨ŪēėžßÄŽßĆ, žĚīŽäĒ ŽįėžĚÄ ŽßěÍ≥† ŽįėžĚÄ ŪčÄŽ¶įŽč§. žó≠žā¨ž†ĀžúľŽ°ú žĚīžä¨ŽěĆ ž†úÍĶ≠žĚÄ žĄłÍłą(žßÄž¶ąžēľ)ŽßĆ ŽāīŽ©ī žĘÖÍĶźžĚė žěźžú†Ž•ľ ŪóąŽĚĹŪēėŽäĒ, ŽčĻžčúŽ°úžĄúŽäĒ ŽÜÄŽĚľžöī ÍīÄžö©žĚĄ Ž≥īžėÄŽč§.
žöįŽ¶¨ÍįÄ Í≤ĹÍ≥ĄŪēīžēľ Ūē† Í≤ÉžĚÄ Ž¨īžä¨Ž¶ľžĚīŽĚľŽäĒ 'žā¨ŽěĆ'žĚī žēĄŽčąŽĚľ, Í∑łŽď§žĚĄ žā¨Ž°úžě°Í≥† žěąŽäĒ ÍĪįžßú žėĀÍ≥ľ, Í∑łŽď§žĚĄ ž†ĀžúľŽ°úŽßĆ Í∑úž†ēŪēėžó¨ Ūėźžė§Ž•ľ ž°įžě•ŪēėŽäĒ žöįŽ¶¨žĚė ŽčęŪěĆ ŽßąžĚĆžĚīŽč§. ÍłįŽŹÖÍĶźžĚłŽď§žĚÄ žč≠žěźÍĶįžĚė žĻľžĚī žēĄŽčĆ, žč≠žěźÍįÄžĚė žā¨ŽěϞ̥ Žď§Í≥† Í∑ł žó≠žā¨žĚė ŪėĄžě•žúľŽ°ú Žď§žĖīÍįÄžēľ ŪēúŽč§. Í∑łŽď§ ŽėźŪēú ŪēėŽāėŽčėžĚė ŪėēžÉĀŽĆÄŽ°ú žßÄžĚƞ̥ ŽįõžĚÄ, žěÉžĖīŽ≤ĄŽ¶į žĖώ吏ĚīÍłį ŽēĆŽ¨łžĚīŽč§.
žó≠žā¨ŽäĒ žěČŪĀ¨ÍįÄ žēĄŽčĆ žā∂žúľŽ°ú žďįžĚłŽč§
žĪ̥֞ ŽćģžúľŽ©į ŽāėŽäĒ žįĹŽįĖžĚĄ Ž≥łŽč§. Ž∂Ąž£ľŪēėÍ≤Ć žõÄžßĀžĚīŽäĒ žā¨ŽěĆŽď§, ŽĻĆŽĒ© žą≤žĚė Ž∂ąŽĻõ, ÍĪįŽ¶¨Ž•ľ ŪĚźŽ•īŽäĒ žěźŽŹôžį®žĚė Ž¨ľÍ≤į. žĚī Ž™®Žď† ŪíćÍ≤ĹžĚī Í∑łž†Ä ŪĚėŽü¨ÍįÄŽäĒ žĚľžÉĀžĚī žēĄŽčąŽĚľ, žöēŽßĚÍ≥ľ žč†ŽÖźžĚī Ží§žóČžľú ŽßƎ吏ĖīŽāīŽäĒ ÍĪįŽĆÄŪēú žó≠žā¨žĚė ŪėĄžě•žěĄžĚĄ ÍĻ®ŽčęŽäĒŽč§.
žó≠žā¨ŽäĒ ŽįēŽ¨ľÍīÄžóź ÍįáŪěĆ žú†Ž¨ľžĚī žēĄŽčąŽč§. žė§Žäė ŽčĻžč†žĚī ŪíąžĚÄ žěĎžĚÄ žöēŽßĚ, ŽčĻžč†žĚī ŪĀīŽ¶≠Ūēú ŽČīžä§, ŽčĻžč†žĚī Ž¨īŽ¶é ÍŅáÍ≥† ÍłįŽŹĄŪēėŽäĒ Í∑ł žč†ŽÖźžĚė ž°įÍįĀŽď§žĚī Ž™®žó¨ ŽāīžĚľžĚė žĄłÍ≥Ąžā¨Ž•ľ ŽßƎč§. žöįŽ¶¨ŽäĒ žó≠žā¨žĚė Žį©ÍīÄžěźÍįÄ žēĄŽčąŽĚľ, ŪēėŽāėŽčėžĚė ÍĪįŽĆÄŪēú ÍĶ¨žÜćžā¨(Redemptive History) žÜćžóźžĄú ÍįĀžěźžĚė ŪéėžĚīžßÄŽ•ľ žć® ŽāīŽ†§ÍįÄŽäĒ žěĎÍįĎ吏ĚīŽ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