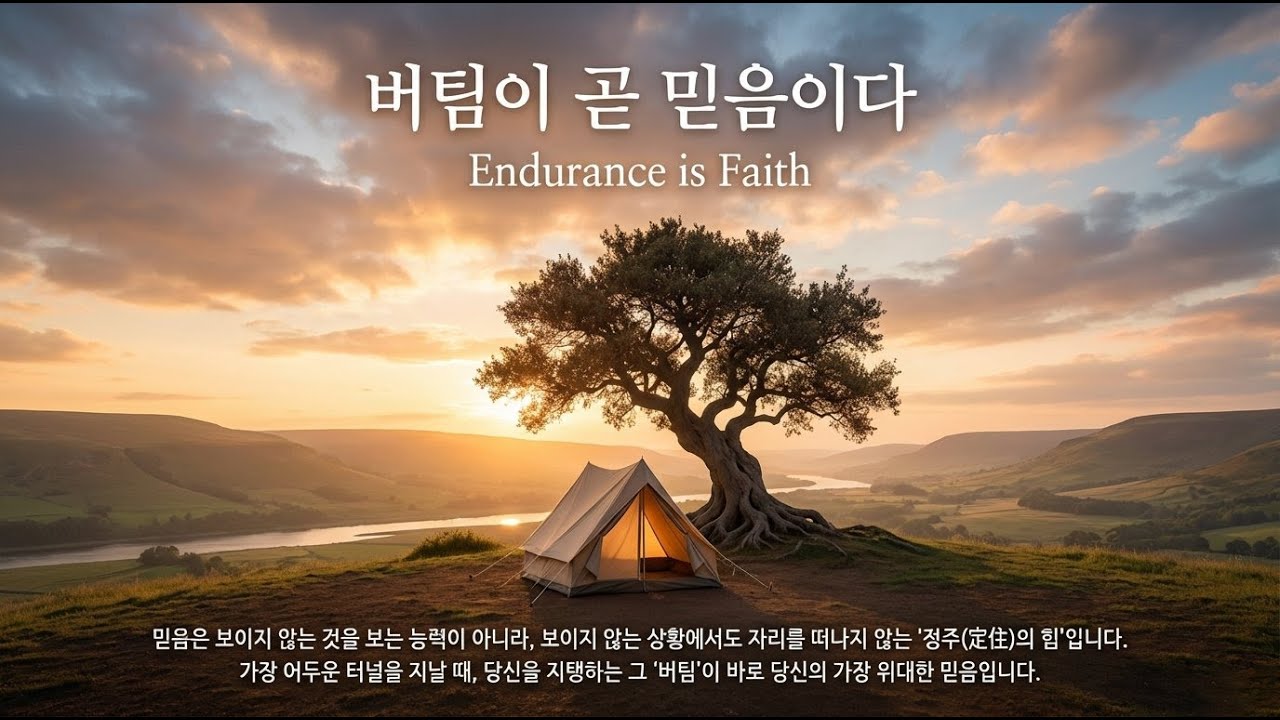žöįŽ¶¨ŽäĒ Žß§žĚľ ‚ÄėžāĎ‚Äô žÜĆŽ¶¨žôÄ Ūē®ÍĽė žāįŽč§. ŽßąŪäł Í≥ĄžāįŽĆĞ󟞥ú, ŽŹĄžĄúÍīĞ󟞥ú, ŪėĻžĚÄ ŪėĄÍīÄ žēěžóź ŽÜďžĚł ŪÉĚŽįį žÉĀžěź žúĄžóźžĄú žöłŽ¶¨ŽäĒ žĚī žßßÍ≥† ÍĪīž°įŪēú ÍłįÍ≥ĄžĚĆžĚÄ ŪėĄŽĆÄ žěźŽ≥łž£ľžĚėÍįÄ žą® žČ¨ŽäĒ žÜĆŽ¶¨žôÄŽŹĄ ÍįôŽč§. Í≤ÄžĚÄ ŽßČŽĆÄžôÄ ŪĚį žó¨ŽįĪžĚī ÍĶźžį®ŪēėŽäĒ ÍłįŽ¨ėŪēú ž§ĄŽ¨īŽä¨, ŽįĒžĹĒŽďú(Barcode). žĚīÍ≤ÉžĚÄ ŽĄąŽ¨īŽāė ŪĚĒŪēīžĄú Ūą¨Ž™Ö žĚłÍįĄž≤ėŽüľ žó¨Í≤®žßÄžßÄŽßĆ, žā¨žč§ žĚī žěĎžĚÄ Ž¨īŽä¨ žēąžóźŽäĒ žĚłŽ•ėžĚė Ž¨łŽ™ÖžĚĄ žßÄŪÉĪŪēėŽäĒ ÍĪįŽĆÄŪēú ž†ēŽ≥īžĚė ŪėąÍīÄžĚī ŪĚźŽ•īÍ≥† žěąŽč§.
ŪēėžßÄŽßĆ, žĚī žį®ÍįÄžöī ŽĒĒžßÄŪĄł ÍłįŪėłžĚė žčúžěĎžĚī Žú®ÍĪįžöī ŪÉúžĖĎžĚī ŽāīŽ¶¨ž¨źŽäĒ ŽßąžĚīžē†ŽĮł ŪēīŽ≥ÄžĚė Ž™®Žěėžā¨žě• žúĄžėĎ觎äĒ žā¨žč§žĚĄ ÍłįžĖĶŪēėŽäĒ žĚīŽäĒ ŽďúŽ¨ľŽč§. žė§Žäė ŽāėŽäĒ Í∑ł ŪĚĎŽįĪžĚė ž§ĄŽ¨īŽä¨ Ží§žóź žą®Í≤®žßĄ, Ūēú žĚłÍįĄžĚė Í≥†ŽáĆžôÄ žöįžóį, Í∑łŽ¶¨Í≥† ŽĎźŽ†§žõÄžĚī Ží§žĄěžĚł žĄúžā¨žčúŽ•ľ žĚīžēľÍłįŪēėŽ†§ ŪēúŽč§.
ŪĆĆŽŹĄ žÜĆŽ¶¨ žā¨žĚīžóźžĄú ŪÉĄžÉĚŪēú žĻ®Ž¨ĶžĚė žĖłžĖī
žčúÍįĄžĚĄ ÍĪįžä¨Žü¨ 1948ŽÖĄžúľŽ°ú ÍįÄŽ≥īžěź. ž†ĄžüĀžĚė žÉĀŪĚĒžĚī žĪĄ ÍįÄžčúžßÄ žēäžĚÄ žčúž†ą, ž≤≠ŽÖĄ ŽÖłŽ®ľ ž°įžÖČ žöįŽďúŽěúŽďúŽäĒ ÍĻäžĚÄ Í≥†ŽĮľžóź ŽĻ†ž†ł žěąžóąŽč§. Ž¨ľÍĪīžĚė ž†ēŽ≥īŽ•ľ žěźŽŹôžúľŽ°ú žĚĹžĖīŽāīŽäĒ žčúžä§ŪÖú, Í∑łÍ≤ÉžĚÄ ŽčĻžčúŽ°úžĄúŽäĒ ŽßąŽ≤ēÍ≥ľŽŹĄ ÍįôžĚÄ žĚľžĚīžóąŽč§. žóįÍĶ¨žóź žßÄžĻú Í∑łŽäĒ ŽŹĄŽßĚžĻėŽďĮ ŽßąžĚīžē†ŽĮł ŪēīŽ≥ÄžĚė ž°įŽ∂ÄŽ™®Žčė ŽĆĀžĚĄ žįĺžēėŽč§.
ŽĒįÍįÄžöī ŪĖážāīÍ≥ľ Í∑úžĻôž†ĀžĚł ŪĆĆŽŹĄ žÜĆŽ¶¨ŽßĆžĚī ÍįÄŽďĚŪēú Í∑łÍ≥≥žóźžĄú, Í∑łžĚė Ž®łŽ¶ŅžÜćžĚĄ žä§žĻú Í≤ÉžĚÄ žóČŽöĪŪēėÍ≤ĆŽŹĄ žÜĆŽÖĄ žčúž†ąžóź Žįįžöī ‚ÄėŽ™®žä§ Ž∂ÄŪėł‚ÄôžėÄŽč§. ‚ÄėŽŹą, ŽŹą, žł†, žł†...‚Äô ž†źÍ≥ľ žĄ†žúľŽ°ú žĚīŽ£®žĖīžßĄ žÜĆŽ¶¨žĚė žĖłžĖī. Í∑łŽäĒ Ž¨īžč¨žĹĒ žÜźÍįÄŽĚĹ ŽĄ§ ÍįúŽ•ľ Ž™®Žěėžā¨žě•žóź ŪĎĻ žįĒŽü¨ ŽĄ£Í≥†ŽäĒ žěźžč†žĚė Ž™łž™ĹžúľŽ°ú ž≠ąžöĪ ŽĀĆžĖīŽčĻÍ≤ľŽč§.
Í∑ł žąúÍįĄ, Ž™®Žěė žúĄžóźŽäĒ ŽĄ§ ÍįúžĚė Íłī žĄ†žĚī žÉĚÍ≤®Žā¨Žč§. žÜźÍįÄŽĚĹžĚė ŪěėÍ≥ľ ÍįĀŽŹĄžóź ŽĒįŽĚľ ÍĶĶÍłįÍįÄ ž†úÍįĀÍįĀžĚł žĄ†Žď§. žöįŽďúŽěúŽďúŽäĒ Í∑ł Ž™®Žěė Í∑łŽ¶ľžĚĄ ŽāīŽ†§Žč§Ž≥īŽ©į ž†Ąžú®ŪĖąŽč§. ‚ÄúžÜĆŽ¶¨Ž•ľ žčúÍįĀžúľŽ°ú ŽįĒÍŅÄ žąė žěąŽč§Ž©ī?‚ÄĚ ž†źžĚÄ žĖážĚÄ žĄ†žúľŽ°ú, žĄ†žĚÄ ÍĶĶžĚÄ žĄ†žúľŽ°ú. Í∑łÍ≤ÉžĚÄ žÜĆŽ¶¨žĚė Ž¶¨Žď¨žĚī žčúÍįĀž†ĀžĚł ŪĆ®ŪĄīžúľŽ°ú žĻėŪôėŽźėŽäĒ, žēĄŽā†Ž°úÍ∑łÍįÄ ŽĒĒžßÄŪĄłžĚė žĒ®žēóžĚĄ ŪíąŽäĒ žó≠žā¨ž†ĀžĚł žąúÍįĄžĚīžóąŽč§. ŪõóŽā† Í∑łŽäĒ žĚī žąúÍįĄžĚĄ ‚ÄúŽŹôŪôĒ ÍįôžĚÄ žĚīžēľÍłį‚ÄĚŽĚľÍ≥† ŪöĆžÉĀŪĖąžßÄŽßĆ, Í∑łÍ≤ÉžĚÄ Žč®žąúŪēú žöįžóįžĚī žēĄŽčąžóąŽč§. ž†ąžč§Ūēú žßąŽ¨łžĚĄ ŪíąžĚÄ žěźžóźÍ≤ĆŽßĆ ŪóąŽĚĹŽźú, žěźžóįžĚī ÍĪīŽĄ§ž§Ä žėĀÍįźžĚė žĄ†Ž¨ľžĚīžóąŽč§.
Í≥ľŽÖĀžóźžĄú žßĀžā¨ÍįĀŪėēžúľŽ°ú: žóźÍ≥†(Ego)Ž•ľ Ž≤ĄŽ¶į žö©Íłį
ŪēėžßÄŽßĆ žėĀÍįźžĚī Í≥ß ŪėĄžč§žĚī ŽźėžßÄŽäĒ žēäžēėŽč§. žöįŽďúŽěúŽďúÍįÄ ž≤ėžĚĆ ŪäĻŪ󹎕ľ Žāł ŽĒĒžěźžĚłžĚÄ žöįŽ¶¨ÍįÄ žēĄŽäĒ žßĀžā¨ÍįĀŪėēžĚī žēĄŽčĆ, žĖĎÍ∂Ā Í≥ľŽÖĀžĚĄ ŽčģžĚÄ ‚ÄėŽŹôžč¨žõź(Bull‚Äôs eye)‚Äô Ž™®žĖĎžĚīžóąŽč§. žĖīŽäź Žį©ŪĖ•žóźžĄú žä§žļĒŪēīŽŹĄ žĚĹŪěź žąė žěąŽŹĄŽ°Ě Í≥†žēąŽźú, ŽāėŽ¶ĄŽĆÄŽ°ú žôĄŽ≤ĹŪēú ŪėēŪÉúžėÄŽč§. Í∑łŽü¨Žāė žĄłžÉĀžĚÄ žēĄžßĀ Í∑łžĚė žēĄžĚīŽĒĒžĖīŽ•ľ ŽįõžēĄŽď§žĚľ ž§ÄŽĻĄÍįÄ ŽźėžĖī žěąžßÄ žēäžēėŽč§. žĚĹžĖīŽāľ ŽĻõ(ÍīĎžõź)žĚī žóÜžóąÍłį ŽēĆŽ¨łžĚīŽč§. 1960ŽÖĄŽĆÄ Ž†ąžĚīž†Ä Íłįžą†žĚī ŽįúŽ™ÖŽźėÍ≥† ŽāėžĄúžēľ ŽįĒžĹĒŽďúŽäĒ Íłī žě†žóźžĄú ÍĻ®žĖīŽā† žąė žěąžóąŽč§.
žó¨ÍłįžĄú žöįŽ¶¨ŽäĒ žó≠žā¨ž†ĀžĚł žēĄžĚīŽü¨ŽčąžôÄ Žßąž£ľŪēúŽč§. ŽįĒžĹĒŽďúžĚė ŪĎúž§ÄžĚĄ ž†ēŪēėŽäĒ 1970ŽÖĄŽĆÄžĚė ‚ÄėŽĆÄž†ĄžüĀ‚Äô ŽčĻžčú, žöįŽďúŽěúŽďúŽäĒ IBMŪĆÄžóź žÜćŪēī žěąžóąžßÄŽßĆ, Í≤ĹžüĀžā¨žėÄŽćė RCAŽäĒ žöįŽďúŽěúŽďúžĚė žīąÍłį žēĄžĚīŽĒĒžĖīžĚł ‚ÄėžõźŪėē ŽįĒžĹĒŽďú‚ÄôŽ•ľ Žď§Í≥†ŽāėžôĒŽč§. ŽįėŽ©ī IBMžĚė ŽŹôŽ£Ć ž°įžßÄ ŽĚľžöįžĖīŽäĒ ‚ÄėžąėžßĀžĄ† ŽįĒžĹĒŽďú‚ÄôŽ•ľ ž†úžēąŪĖąŽč§.
žõźŪėēžĚÄ žĚłžáĄŪē† ŽēĆ žěČŪĀ¨ÍįÄ ž°įÍłąŽßĆ Ž≤ąž†łŽŹĄ žė§Ž•ėÍįÄ Žā¨žßÄŽßĆ, žąėžßĀžĄ†žĚÄ žēĄŽěėŽ°ú ŪĚėŽü¨ŽāīŽ†§ŽŹĄ ž†ēŽ≥īŽ•ľ žĚĹŽäĒ Žćį žßÄžě•žĚī žóÜžóąŽč§. žöįŽďúŽěúŽďúŽäĒ ÍįąŽ¶ľÍłłžóź žĄįŽč§. žěźžč†žĚė žõźŽěė žēĄžĚīŽĒĒžĖīžĚł ‚ÄėžõźŪėē‚ÄôžĚĄ Í≥†žßĎŪē† Í≤ɞ̳ÍįÄ, žēĄŽčąŽ©ī ŽćĒ žč§žö©ž†ĀžĚł ŽŹôŽ£ĆžĚė ‚ÄėžąėžßĀžĄ†‚ÄôžĚĄ žßÄžßÄŪē† Í≤ɞ̳ÍįÄ. Í∑łŽäĒ ŽÜÄŽěćÍ≤ĆŽŹĄ ŪõĄžěźŽ•ľ ŪÉĚŪĖąŽč§. ŽįúŽ™ÖÍįÄŽ°úžĄú žěźž°īžč¨Ž≥īŽč§ Íłįžą†žĚė žôĄžĄĪžĚĄ ŪÉĚŪēú Í∑łžĚė Í≤įŽč®žĚī žóÜžóąŽč§Ž©ī, žė§ŽäėŽā† žöįŽ¶¨ŽäĒ Í≥ĄžāįŽĆĞ󟞥ú žóČŽöĪŪēú Ž¨ľÍĪīÍįížĚī žįćŪ칎äĒ ŪėľŽěĞ̥ Í≤™Í≥† žěąžĚĄžßÄŽŹĄ Ž™®Ž•łŽč§. žěźžč†žĚė ‚ÄėžóźÍ≥†‚ÄôŽ•ľ ž£ĹžĚīÍ≥† ‚ÄėžĶúžĄ†‚ÄôžĚĄ žĄ†ŪÉĚŪēú Í∑ł Í≤łžÜźŪē®žĚīžēľŽßźŽ°ú ŽįĒžĹĒŽďúŽ•ľ žĄłÍ≥Ą ŪĎúž§ÄžúľŽ°ú ŽßĆŽď† žßĄžßú ŪěėžĚīžóąŽč§.
ŽĎźŽ†§žõÄžĚī ŽĻöžĖīŽāł ÍīīŽ¨ľ: žõźžą≠žĚīžôÄ 666
žÉąŽ°úžöī Íłįžą†žĚÄ žĖłž†úŽāė ŪôėžėĀŽįõŽäĒÍįÄ? žēĄŽčąŽč§. žĚłŽ•ėŽäĒ Ž≥łŽä•ž†ĀžúľŽ°ú ŽāĮžĄ† Í≤ɞ̥ ŽĎźŽ†§žõĆŪēúŽč§. ŽįĒžĹĒŽďúÍįÄ žÉĀžö©ŪôĒŽźėŽćė žčúÍłį, žā¨ŽěƎ吏ĚÄ Ž≥īžĚīžßÄ žēäŽäĒ Ž∂ČžĚÄ ŽĻõ, ‚ÄėŽ†ąžĚīž†Ä‚ÄôŽ•ľ Í≥ĶŪŹ¨žĚė ŽĆÄžÉĀžúľŽ°ú žó¨Í≤ľŽč§. IBM Ž≥ÄŪėłžā¨Žď§žĚÄ ‚Äúžä§žļźŽĄąÍįÄ žā¨ŽěĆ ŽąąžĚĄ Ž©ÄÍ≤Ć Ūē† Í≤É‚ÄĚžĚīŽĚľŽäĒ žÜƞܰžĚĄ ÍĪĪž†ēŪēī ž†Ąž†ĄÍłćÍłćŪĖąŽč§. ÍłČÍłįžēľ ÍįúŽįúŪĆÄžĚÄ Ž†ąžĚīž†ÄžĚė žēąž†ĄžĄĪžĚĄ ž¶ĚŽ™ÖŪēėÍłį žúĄŪēī žēĄŪĒĄŽ¶¨žĻīžóźžĄú žõźžą≠žĚīŽ•ľ Í≥ĶžąėŪēī žôÄ žč§ŪóėÍĻĆžßÄ ÍįźŪĖČŪēīžēľ ŪĖąŽč§. Ž¨łŽ™ÖžĚė žĚīÍłįÍįÄ žõźžčúžĚė žÉĚŽ™Öž≤īŽ•ľ ŪÜĶŪēī Í≤Äž¶ĚŽįõžēĄžēľ ŪĖąŽćė, žõÉžßÄ Ž™ĽŪē† žīĆÍ∑ĻžĚīžóąŽč§.
ŽćĒžöĪ ÍłįžĚīŪēú Í≤ÉžĚÄ žĘÖÍĶźž†Ā ÍīĎÍłįžėÄŽč§. ŽįĒžĹĒŽďúžĚė žĖĎ ŽĀĚÍ≥ľ ÍįÄžöīŽćįžóź žěąŽäĒ Íłī ÍįÄžĚīŽďúŽĚľžĚłžĚī žĄĪÍ≤Ĺ žöĒŪēúÍ≥ĄžčúŽ°Ěžóź Žāėžė§ŽäĒ žßźžäĻžĚė žąęžěź ‚Äė666‚ÄôžĚĄ žēĒžčúŪēúŽč§ŽäĒ žĚĆŽ™®Ž°†žĚī Žď§Ž∂ąž≤ėŽüľ Ž≤ąž°ĆŽč§. žā¨ŽěƎ吏ĚÄ žĚī Ū鳎¶¨Ūēú ŽŹĄÍĶ¨ÍįÄ žĚłÍįĄžĚĄ ŪÜĶž†úŪēėŽäĒ ‚ÄėžēÖŽßąžĚė ŪĎúžčĚ‚ÄôžĚīŽĚľ ŽĮŅžúľŽ©į ÍĪįŽ∂ÄŪĖąŽč§. 2014ŽÖĄ Žü¨žčúžēĄžĚė Ūēú žöįžú† ŪöĆžā¨ÍįÄ ŽįĒžĹĒŽďú žúĄžóź Ž∂ČžĚÄ žč≠žěźÍįÄŽ•ľ Í∑łŽ†§ ŽĄ£žóąŽćė ŪēīŪĒĄŽčĚžĚÄ, Íłįžą†žĚė žį®ÍįÄžöī žßĄŽ≥ī žÜ掏ĄŽ•ľ ŽĒįŽĚľÍįÄžßÄ Ž™ĽŪēėŽäĒ žĚłÍįĄ ŽßąžĚĆžĚė žóįžēĹŪē®žĚĄ Ž≥īžó¨ž£ľŽäĒ žĄúÍłÄŪĒą žěźŪôĒžÉĀžĚīŽč§. žöįŽ¶¨ŽäĒ Ū鳎¶¨Ūē®žĚĄ žõźŪēėŽ©īžĄúŽŹĄ, ŽŹôžčúžóź Í∑ł Ū鳎¶¨Ūē® Ží§žóź žą®žĚÄ ŪÜĶž†úžôÄ ÍįźžčúŽ•ľ Ž≥łŽä•ž†ĀžúľŽ°ú ŽĎźŽ†§žõĆŪēėŽäĒ Ž™®žąúž†ĀžĚł ž°īžě¨žĚł Í≤ÉžĚīŽč§.
15,000Žč¨Žü¨žĚė ÍįÄžĻė, Í∑łŽ¶¨Í≥† Žā®Í≤®žßĄ žßąŽ¨ł
žöįžó¨Í≥°ž†ą ŽĀĚžóź 1974ŽÖĄ 6žõĒ, žė§ŪēėžĚīžė§ž£ľžĚė Ūēú žäąŪ澎߹žľďžóźžĄú ÍĽĆ Ūēú ŪÜĶžĚī ‚ÄėžāĎ‚Äô žÜĆŽ¶¨žôÄ Ūē®ÍĽė ŪĆĒŽ†§ŽāėÍįĒŽč§. Í∑ł žÜĆŽ¶¨ŽäĒ ŽĆÄŽüČ žÜĆŽĻĄ žā¨ŪöĆžĚė ÍįúŽßȞ̥ žēĆŽ¶¨ŽäĒ žč†ŪėłŪÉĄžĚīžóąŽč§. žė§ŽäėŽā† ŽįĒžĹĒŽďúŽäĒ ŪēėŽ£® žąėžč≠žĖĶ Ž≤ą žä§žļĒŽźėŽ©į ž≤úŽ¨łŪēôž†ĀžĚł ÍįÄžĻėŽ•ľ žįĹž∂úŪēúŽč§. Í∑łŽü¨Žāė ž†ēžěĎ žĚī ŪėĀŽ™ÖžĚė žįĹžčúžěź žöįŽďúŽěúŽďúžôÄ žč§Ž≤ĄÍįÄ ŪäĻŪ󹎰ú Ž≤ą ŽŹąžĚÄ Žč®ŽŹą 15,000Žč¨Žü¨žóź Ž∂ąÍ≥ľŪĖąŽč§.
žĖīž©ĆŽ©ī žĚīÍ≤ÉžĚÄ žĄłžÉĀžĚė žĚīžĻėžĚľžßÄ Ž™®Ž•łŽč§. žúĄŽĆÄŪēú ŪėĀžč†žĚÄ ŽĆÄÍįú žįĹžčúžěźžóźÍ≤Ć ŽßČŽĆÄŪēú Ž∂ÄŽ•ľ žēąÍ≤®ž£ľÍłįŽ≥īŽč§, žĄłžÉĀ ž†Ąž≤īŽ•ľ ŪíćžöĒŽ°≠Í≤Ć ŪēėŽäĒ Žį©žčĚžúľŽ°ú Ž≥īžÉĀŽźúŽč§. Í∑łŽď§žĚÄ ŽŹą ŽĆÄžč†, žĚłŽ•ėžĚė žā∂žĚĄ Í∑ľŽ≥łž†ĀžúľŽ°ú ŽįĒÍĺłžóąŽč§ŽäĒ Ž™ÖžėąŽ•ľ žĖĽžóąŽč§. Ž™®Žěėžā¨žě•žĚė ŽāôžĄúÍįÄ ž†Ą žĄłÍ≥ĄŽ•ľ žěáŽäĒ ÍĪįŽĆÄŪēú žēĹžÜćžĚī ŽźėÍłįÍĻĆžßÄ, Í∑łŽď§žĚī Í≤™žóąžĚĄ žąėŽßéžĚÄ Ž∂ąŽ©īžĚė Žį§žĚĄ žÉĚÍįĀŪēúŽč§.
žĚľžÉĀžĚė Ž¨īŽä¨Ž•ľ Žč§žčú Ž≥īŽč§
žĚīž†ú Žč§žčú, ŽčĻžč†žĚė žÜźžóź Žď§Ž¶į Ž¨ľÍĪīžĚĄ ŽįĒŽĚľŽ≥īŽĚľ. Í∑łÍ≥≥žóź žįćŪěĆ ŪĚĎŽįĪžĚė ž§ĄŽ¨īŽä¨ŽäĒ Žč®žąúŪēú ÍįÄÍ≤©ŪĎúÍįÄ žēĄŽčąŽč§. Í∑łÍ≤ÉžĚÄ Ž™®žä§ Ž∂ÄŪėłŽĚľŽäĒ Í≥ľÍĪįžĚė žú†žāįÍ≥ľ Ž†ąžĚīž†ÄŽĚľŽäĒ ŽĮłŽěėžĚė Íłįžą†, Í∑łŽ¶¨Í≥† žĚłÍįĄžĚė ŽĎźŽ†§žõÄÍ≥ľ Í∑łÍ≤ɞ̥ ŽĄėžĖīžĄ† žö©ÍłįÍįÄ žīėžīėŪēėÍ≤Ć žóģžĚł žó≠žā¨žĚė žßĀŽ¨ľžĚīŽč§.
ÍįÄžě• žúĄŽĆÄŪēú Ž≥ÄŪôĒŽäĒ ŽēĆŽ°ú ÍįÄžě• žā¨žÜĆŪēú Í≥≥žóźžĄú žčúžěĎŽźúŽč§. ŪēīŽ≥ÄžĚė Ž™®ŽěėžēĆž≤ėŽüľ žąėŽßéžĚÄ žēĄžĚīŽĒĒžĖīÍįÄ žöįŽ¶¨ Í≥ĀžĚĄ žä§ž≥ź ÍįĄŽč§. žöįŽďúŽěúŽďúÍįÄ Ž™®Žěė žúĄžóź žÜźÍįÄŽĚŞ̥ ÍĹāžēėŽćė Í∑ł žąúÍįĄž≤ėŽüľ, žė§Žäė ŽčĻžč†žĚė Ž¨īžč¨Ūēú žÉĚÍįĀ ŪēėŽāėÍįÄ ŽāīžĚľžĚė žĄłžÉĀžĚĄ ŽįĒÍŅÄ ŽįĒžĹĒŽďúÍįÄ ŽźėžßÄ žēäžúľŽ¶¨ŽěÄ Ž≤ēžĚī žĖīŽĒĒ žěąŽäĒÍįÄ. Í∑łŽü¨Žčą žĚľžÉĀžĚĄ žú†žč¨Ūěą ÍīÄžįįŪēėŽĚľ. ŪėĀžč†žĚė Žč®žĄúŽäĒ žĖłž†úŽāė žöįŽ¶¨ ŽįúŽįĎ, Ž™®Žěėžā¨žě• žĖīŽĒėÍįÄžóź žą®žĖī ŽčĻžč†žĚė žÜźÍłłžĚĄ ÍłįŽč§Ž¶¨Í≥† žěąŽ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