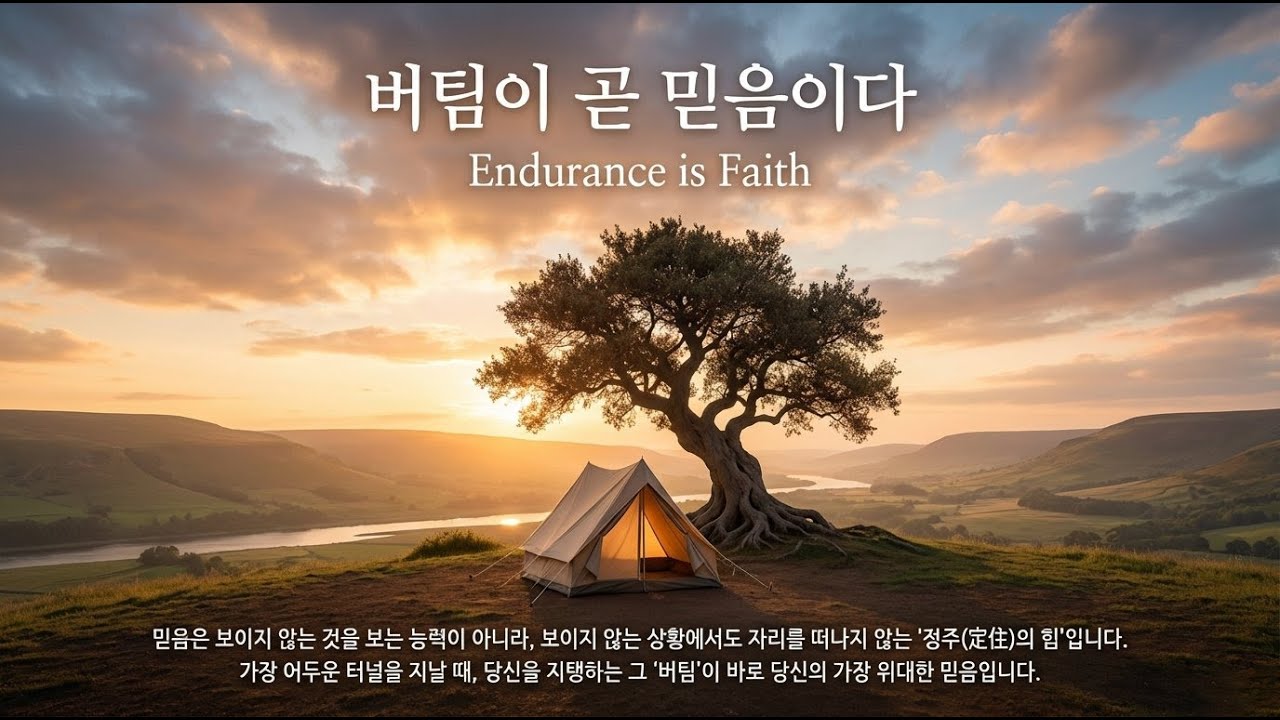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는 제목부터 강렬하다. 서울에 자가를 가지고, 대기업에 다니며, 가족까지 있는 중년 남성 김 부장.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한 인생’의 표본처럼 보인다.
그러나 드라마는 이 표면적 성공 뒤에 감춰진 깊은 허무와 외로움을 담담히 드러낸다. 웃기지만 슬프고, 현실적이지만 낯설 만큼 공감되는 장면들 속에서 시청자들은 스스로의 삶을 비춰본다. 이 작품은 단순한 직장 코미디가 아니라,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대의 자화상이다.

김 부장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좋은 대학, 대기업 입사, 결혼, 내 집 마련.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성공의 단계를 착실히 밟아왔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
드라마 속 김 부장은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간다. 그가 느끼는 감정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온 40~50대 직장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피로, 불안,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대변한다.
결국 김 부장의 ‘딜레마’는 물질적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결핍이다. 이 드라마는 그 허전함의 정체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중년의 위기를 ‘사회적 현상’으로 끌어올린다.
김 부장은 서울 자가를 소유했지만, 그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다. 가족은 각자의 디지털 세계에 갇혀 있고, 대화는 줄어들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와이프의 ‘무관심’과 아이의 ‘무응답’이 그를 맞이한다.
이 장면들은 많은 시청자에게 낯익은 불편함을 준다. 외형적 안정은 갖췄지만, 정서적 관계는 단절된 현대 가정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 김 부장은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다.
그의 공허함은 곧 한국 중산층의 불안을 상징한다. 집값, 학비, 회사의 생존경쟁 속에서 삶은 점점 ‘유지의 연속’이 되고, 행복은 ‘사치스러운 단어’로 밀려난다. 드라마는 이러한 현실을 블랙코미디 형식으로 날카롭게 풍자한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화려한 연출보다 일상의 디테일로 시청자의 마음을 파고든다. 회사에서의 무의미한 회의, 상사와의 눈치싸움, 가족 간의 미묘한 거리감.
특히 김 부장이 술에 취해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라고 묻는 장면은 방송 후 수많은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시청자들은 댓글로 “이건 내 얘기다”, “이 드라마는 다큐멘터리다”라며 공감했다.
결국 이 드라마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행복은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과정이다. 김 부장은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가?”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다. 대기업, 아파트, 가족이 전부 인 것 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결핍과 허무가 자리한다. 이 드라마는 우리가 오래도록 믿어온 성공의 공식을 해체하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만든다.
김 부장은 허구의 인물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또 다른 이름이다. 드라마는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안식이다.”